조폭 닮은 '언론사 노동 문화'
[언론 다시보기] 권태호 한겨레신문 출판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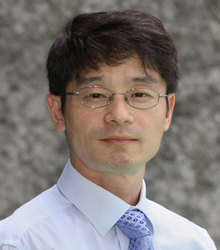 얼마 전 한 신문사 부국장의 칼럼이 회자됐다. ‘칼퇴근 판사’의 ‘워라밸’ 풍조(?)를 개탄했다. 기자 초년 시절 자신의 살인적 노동을 풀어놓기도 했다. 예상대로 수많은 비난이 달렸다. 그보다 2년 늦게 기자가 됐다. 비슷한 날들을 지났다. 지금도 큰 아이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다. 얼마전까지 부장을 할 때는, 저녁 약속이 없으면 그냥 회사에 있었다. 그러니 집에는 늘 밤 11~12시에 도착했다. 별로 힘들지 않았다. 힘든 일을 계속하긴 힘들다. 내 또래 기자들이 다 그리 살았다. 그런데 그리 지나온 삶이 자랑스럽기보단 민망하다. 그리 긴 시간 일했으니, 지금쯤이면 ‘펜대를 거꾸로 잡아도 특종’을 하거나, ‘앉은 자리 일필휘지로 칼럼’을 제꺽 써내려야 할 터인데, 여전히 7매 짜리에 밤을 앓는다.
얼마 전 한 신문사 부국장의 칼럼이 회자됐다. ‘칼퇴근 판사’의 ‘워라밸’ 풍조(?)를 개탄했다. 기자 초년 시절 자신의 살인적 노동을 풀어놓기도 했다. 예상대로 수많은 비난이 달렸다. 그보다 2년 늦게 기자가 됐다. 비슷한 날들을 지났다. 지금도 큰 아이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다. 얼마전까지 부장을 할 때는, 저녁 약속이 없으면 그냥 회사에 있었다. 그러니 집에는 늘 밤 11~12시에 도착했다. 별로 힘들지 않았다. 힘든 일을 계속하긴 힘들다. 내 또래 기자들이 다 그리 살았다. 그런데 그리 지나온 삶이 자랑스럽기보단 민망하다. 그리 긴 시간 일했으니, 지금쯤이면 ‘펜대를 거꾸로 잡아도 특종’을 하거나, ‘앉은 자리 일필휘지로 칼럼’을 제꺽 써내려야 할 터인데, 여전히 7매 짜리에 밤을 앓는다.
그 부국장이 말하려던 바는 기자, 판검사 등 엘리트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강조다. 수긍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어떤 형태로든 좀 더 사회에 기여해야 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자신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 사회 ‘엘리트 집단’들의 노동·조직 문화가 사회를 위한 명예로운 자발적 희생보다 조폭처럼 조직의 보위에 더 맞춰져 왔다고 본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그래서 엘리트일수록 더 조폭스러웠고, 조폭 엘리트들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더욱 조폭스럽게 만들었다. 특히 언론사는 조폭 구조와 흡사했다. 조직을 위한 헌신, 강한 위계, 나와바리(구역) 지키기, 떼 마와리(몰려다니기)까지.
초기에 집중적인 업무는 빠른 시간 안에 기능을 압축적으로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다. 하나는 생각을 중단하게 되고, 그 결과 속한 조직으로의 동화(同化)가 급속도로 이뤄진다.
온몸과 시간을 갈아, 속한 조직에 최선을 다하는 게, 단순 사회에선 효능감이 있었다. 그러나 복잡다기한 현 사회에선 이젠 조직에도 더 이상 도움될 것 같지 않다. 숙련도에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동한다. 학습과 놀이가 병행되지 않는 일은 정체, 그 다음엔 후퇴 수순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개성과 매력이 사라진 충실한 조직원만 남게 된다. 일에만 매몰되면 세상을 쫓는 기자가, 정작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된다. 때로 기자들이 대중의 보편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이유다.
소설가 김훈은 “기자를 보면 기자 같고, 형사를 보면 형사 같고, 검사를 보면 검사 같은 자들은, 노동 때문에 망가진 것이다. 뭘 해먹고 사는지 감이 안 와야 그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다”라고 말했다. 기자라고, 판검사라고,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직업에 머문다면, ‘나’는 무엇인가. <조선일보>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답지 않아야 하고, <한겨레신문> 기자가 <한겨레신문> 기자답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기자’에 더 가깝다. 나침반의 빨간 침은 늘 북쪽을 가리키지만, 끊임없이 파르르 떤다. 침이 흔들리지 않고, 반듯이 고정된 채 정북향을 가리킨다면, 고장난 것이다. 버려야 한다. 확신에 찬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법이다.
전형성을 벗어나려면 늘 사고해야 하고, 그러려면 조직논리에 매몰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행복스러워야 한다. 그러려면 적당히 일해야 한다. 시간에 숨 구멍을 뚫어줘야 한다. 대신, 일의 밀도는 높여야 한다. 응? 으음…, 결국, 나도 꼰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