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치국 한 그릇, 하루를 살아낼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
[기슐랭 가이드] 강원 삼척 만남의식당
출장지였던 강원 삼척 바닷가에 있는 한 여관방에서 맞이한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 속이 쓰렸다. 전날 저녁 취재원 등과 어울려 술을 들이부은 탓이다. 하루가 힘들 것 같다는 예감이 슬슬 밀려올 때쯤,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려대며 적막감을 쫓는다. 엊저녁 늦게까지 술집을 누빈 역전의 용사 전화다. 삼척항 인근에 있는 ‘만남의식당’에서 곰치국 한 그릇 시켜놓고 속풀이 하잔다. 낯설었지만, 대도시나 내륙 지역에선 접하기 힘든 메뉴란 것을 알았기에 흔쾌히 동의했다. 식당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문 앞에 쪼그려앉아 곰치를 직접 손질하는 모습이 현지인 맛집 포스다.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곰치국은 지역민들이 즐겨 찾는 토속음식이자 별미다. 주재료인 곰치는 지역별로 물메기·물텀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생선으로, 살이 무르고 못생긴 모양새 때문에 옛날엔 먹지 않고 버리기도 했단다. 그렇게 예전엔 천대받던 생선이 이젠 제법 귀한 몸이 돼 곰치국 한 그릇 값이 2만원선이다.
맑은국으로 먹기도 하지만 삼척에선 보통 숭덩숭덩 거칠게 썬 묵은지를 넣고 팔팔 끓여낸다. 칼칼한 맛이 해장용으로 안성맞춤이지만 마치 콧물을 연상케하는 곰치살의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린다. ‘비싼 김칫국’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따른다. 젓가락으로는 곰치살을 절대 집을 수 없고, 숟가락에 애써 올려도 자칫 부주의하면 이내 주르륵 흘러내려 다시 그릇으로 풍덩 들어갈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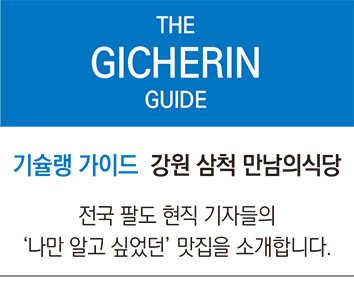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시원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온몸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먹는다. 그러다 보면 비로소 눈에 초점이 생기고 사위가 분간된다. 여유가 생겨 식당을 휘 둘러보면 온통 애주가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저마다 그릇에 코를 박고 곰치국을 흡입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그렇게 또 새로운 하루를 어찌어찌 살아낼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뭐니해도 뜨끈한 국물 생각이 간절해지는 게 겨울철 아침이다. 출장이든 여행이든 삼척 인근을 방문할 일이 생긴다면 한 번쯤 경험 삼아 곰치국을 접해보길 추천한다. 이곳의 또 다른 메뉴인 대구해장국도 많은 이들이 찾는다. 늦게 가면 날에 따라 곰치나 대구가 소진될 수 있다.
※‘기슐랭 가이드’ 참여하기
▲대상: 한국기자협회 소속 현직 기자.
▲내용: 본인이 추천하는 맛집에 대한 내용을 200자 원고지 5매 분량으로 기술.
▲접수: 이메일 taste@journalist.or.kr(기자 본인 소속·연락처, 소개할 음식 사진 1장 첨부)
▲채택된 분에겐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