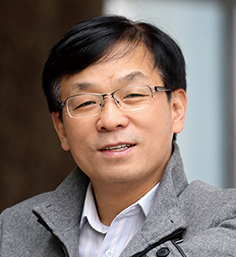
▲이봉현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
이를 통해 어떤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양쪽의 논거는 조금 더 분명해졌다.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가 날로 심해지는 반면, 현행 민·형사소송 제도는 언론보도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쪽은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의 규정조차 모호한데 그 진위를 누구에게 판별하도록 할 것이냐며, 이 제도가 자칫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박한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이 병존하는 과잉규제의 문제, 상법을 통해 언론을 규제하려는 법체계상의 불합리성도 여러 전문가가 지적했다.
법적 정합성이나 법체계의 합리성을 따지는 이런 논의는 물론 필요하다. 그런데 ‘가짜뉴스 대 언론자유’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논쟁의 구도나 법 적용의 실무적 문제에 집중하는 논의를 지켜보면서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 이는 ‘징벌적’이란 표현이 들어가는 규제를 들고 나오는 지경에 이른 언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기사 잘 못 쓰면 문 닫는 언론사가 나와야 한다”는 말을 사석에서 주고받게 된 언론 현실을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가 제대로 담아내고 있느냐는 것이다.
시민들은 언론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나, 일부 소규모 언론사의 일탈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전통매체부터 디지털 1인 매체에 이르기까지 언론 생태계 전반의 역기능이 너무 커졌다고 시민들은 느끼고 있다. 특히 정당의 대변인을 방불케 하는 정파성 짙은 보도, 언론사 입장에 꿰맞춰 사실까지 왜곡하는 보도, 재난이나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보다 덧내는 보도, 클릭수만 노려 양산하는 쓰레기 같은 기사의 문제를 시민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언론 스스로 고쳐나가길 기대했지만 자정기능은 오래전에 멈춰버린 듯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52%에 이른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미디어오늘·리서치 뷰)는 이런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언론통제 목적을 갖고 있건 없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정당성을 끌어내는 원천도 이런 답답한 언론 현실이다.
언론사와 유관 단체들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수호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반대하는 방어논리로 내세웠다. 머지않은 과거, 언론이 권위주의 정권에 짓눌려 있을 때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고 함께 싸웠다. 이는 언론이 그 자유를 통해 시민을 위해 권력을 감시하고, 보통 사람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공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시민들이 이제 언론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책임윤리는 사라지고 언론자유가 언론사와 언론인의 방종으로 변질돼 결국 시민의 온당한 알권리마저 훼손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지금이 언론에게 ‘자유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다. 실상 시민사회에서 언론이 누리는 자유와 특권은 언제나 엄중한 책임을 전제로 했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은 20세기 중반 미국의 언론현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 허친슨위원회가 지향점으로 제시한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는 이 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런 법안까지 등장하게 된 언론 현실을 직시하고 개혁해 나가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법적 정비는 필요하다. 징벌적인 수준은 아니라 해도 잘못 보도한 언론에 경각심을 중 정도까지 법원이 민사상 위자료 인정액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형사와 민사가 뒤섞인 규제 체제도 민사 위주로 정리해야 한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이 자율적으로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고, 이를 이끌어내는 제도적 유인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가짜뉴스와 1인 미디어에 책임을 떠밀지 말고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영향력도 큰 언론사가 먼저 변화에 나서야 한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현재 언론윤리헌장을 다듬고 있다. 각 언론사도 이에 맞춰 취재보도준칙을 정비하고 이를 일상의 보도에서 제대로 지켜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오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보도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자와 소통하는 책무성도 높여가야 한다. 이런 노력을 다하는 언론사에 좀 더 많은 교육, 연수, 수상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언론 지원 체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충격요법’이란 말이 있다. 상황이 정체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판을 흔들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잘못된 언론보도에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법제화하자는 논의도 한국 언론현실에 가해진 충격요법일 수 있다. 비록 처음 제안된 내용으로 입법화는 되지 않을지라도, 이 법안이 품고 있는 문제의식은 언론의 변화와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언론이 목소리를 높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저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럴 명분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닐 것이다. 산비탈을 굴러 내려오는 돌멩이처럼 난데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뉴스가 난무할 때, 언론의 책임을 요구하고 규제를 가하는 법안은 얼마든지 다른 이름을 달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 -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의 전제조건 (2020/11/18)
- -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적용, 신중해야 하는 이유 (2020/11/04)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언론의 자유 (2020/10/28)
- - '악의적 왜곡 보도' 규제하는 언론 개혁에 반대하는가? (2020/10/21)
- - "징벌적 손배제 도입, 언론 신뢰 높일 수 있는 기회" (2020/10/14)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