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공유'서 도시의 미래 본 도시건축전문작가
[기자 그 후] (24) 음성원 에어비앤비 미디어정책총괄(전 한겨레·문화일보 기자)
“전 평생 기자 할 생각이었어요.” 음성원<사진> 에어비앤비 미디어정책총괄은 지난달 25일 인터뷰 중 이 얘길 여러 번 했다. “후배들한테 ‘기자가 짱이다’ ‘기자처럼 좋은 직업이 없다’”던 기자는 2017년 3월 “(관둘) 낌새도 없던 사람이 스스로도 웃기게 (에어비앤비로) 휙 가버렸다.” 기자 일에 대한 동경의 빛을 잃는 실망의 순간이 있어서나 본인 생에 대한 정밀한 ‘플랜’의 실천 차원이 아니라 ‘그게 그리 되더라’는 어투. 결국 우연 가운데 확실한 건 ‘내 것’으로 여겨 꾸준히 가꿔온 관심사뿐이었다.

한겨레에서 그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함 ‘도시전문기자’를 스스로 표방하고 활동했다. 도시와 건축이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곳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공간심리학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도시는 어떻게 기획돼야 하는지 등에 천착했다. 당연히 처음부터 ‘내 것’을 갖긴 어려웠다. 2005년 문화일보 사회부에서 기자생활을 시작, 2~3년차 때부터 3년 간 경제부(기재부, 공정위, 농림부 출입)에서 일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건설사를 1년간 출입하고 사회부 바이스캡, 복지부를 담당하다 2012년 한겨레로 이직했다.
한겨레에서 교육부를 담당하고 행안부와 서울시를 함께 출입하던, 자신의 ‘전공’을 정한 이후 시기가 결정적이었다. “8~9년차쯤에 평생 기자를 하려고 보니 두 길이 있는 거 같았어요. 하나는 편집국장, 또 하나는 전문기자 루트. 검찰이나 정당을 안 해봐서 편집국장은 못되겠다 싶은 거예요.(웃음) 전문기자가 되려고 찾은 게 도시 이슈였는데 서울시 출입을 해야겠는 거예요. 당시 부장에게 A4 두 장짜리 지원서를 막 내고 그랬어요.” 2014년과 2016년 그는 서울시 주요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사회 이슈화해 서울시 대응을 이끄는 기사를 썼다. 2년 간 출입하며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같은 심플한 자료도 모조리 취재해서 다뤘다.
미래팀에서도 ‘도시의 미래’를 지속 다루다 2016년 처음으로 숙박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의 존재를 알게 된다. “해외 출장은 긴장돼서 싫어한다”는 기자는 “같은 팀 남종영 선배가 가라고 가라고 해서” 그리스 산토리니 등 유럽도시에 출장을 갔다가 처음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해봤다. “몰랐으면 옮길 생각도 안했을 텐데 알게 된 거죠. 도시 관련 해외사례를 찾아보다 에어비앤비 공유경제를 통한 일본 요시노 마을의 도시재생 사례 등에서 플랫폼의 역할에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되겠어’란 마음에 지원했는데 덜컥 뽑힌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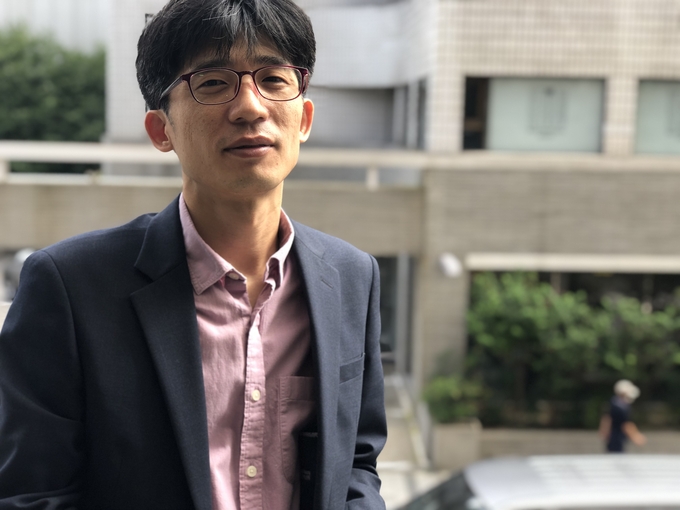
현재 음 총괄은 자신의 일을 “기자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한다. 소셜과 레거시미디어에서 버즈(buzz)를 일으키기 위한 PR업무는 항상 크리에이티브한 프로젝트 발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업무환경은 자유로운 반면 태스크 중심이란 점도 유사하다. 일 대부분은 이메일과 회의를 통해 영어로 이뤄지고 의사결정에서 합의가 매우 중시되는 분위기다. 홍보업무로선 일반 고객 대상의 ‘컨슈머 커뮤니케이션’에 더해 공유경제란 신산업 영역으로서 정책 대응을 맡는 ‘폴리시(policy) 커뮤니케이션’도 신경써야한다는 점이 좀 다르다. 예컨대 내·외국인에 차별을 둔 민박 관련 제도에 대해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그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만 하면 합리적인 룰이 나올 거라 확신하는데 한국사회에 워낙 이슈가 많다보니 별로 중요하게 못 다뤄진다는 게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했다.
어떤 선택과 우연이 맞물려 도착한 지금 돌아보면 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 이슈’로 모든 경험을 연결 짓고 수렴시키는 행보를 걸어온 케이스다. 기자 시절 정책과 경제, 부동산을 주로 취재한 경험은 도시문제와 관련이 있다. 2011년 어학연수를 다녀온 이후엔 뉴욕의 도시계획을 다룬 책을 썼다. 경관생태학 분야 논문을 써 대학원에서 받은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도 이력을 더한다. 무엇보다 현 직장은 숙박 플랫폼 차원을 넘어 국내·외 도시를 배경으로 이뤄지는 일종의 도시적 현상이기도 하다. 어느 곳에서도 ‘내 것’을 놓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재도 그는 홍보 담당자가 아닌 ‘도시건축전문작가’라는 직함으로 자신만의 글을 쓴다. 매일경제, 인터비즈 등에 정기 기고를 하고 있고, 기자 전후 ‘시티 오브 뉴욕’, ‘도시의 재구성’, ‘팝업 시티’ 등 책도 여러 권 저술했다. 요즘엔 문화예술경영학 박사 과정을 밟으며 “도시의 앵커 시설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이기도 한 미술관·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공간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있다. 1978년생 96학번 전직 기자는 인문학과 심리학 등 공간심리학이 가미된 도시설계는 무엇인지, 공간 소비 수요가 다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도시 기획은 어때야 하는지 등을 향후 책으로 쓰려 한다.
“평생 하려던 일을 관두며 아쉬운 점을 ‘부캐’를 키워서 일부 해소했어요.(웃음) 진짜 좋아하는 걸 찾고 어느 출입처에 가든 놓지 않으면 어떨까 싶어요. 한 주제를 여러 분야에서 스스로 융합할 수만 있으면 큰 경쟁력이 돼요. 기자는 어떤 직업보다 다양한 간접경험 기회를 누릴 수 있으니 한껏 누렸으면 합니다. 그러다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안 해볼 이유가 있겠어요?”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