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는 내 아들 개인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
[기자 그 후] (10) '글 쓰는 엄마' 류승연 작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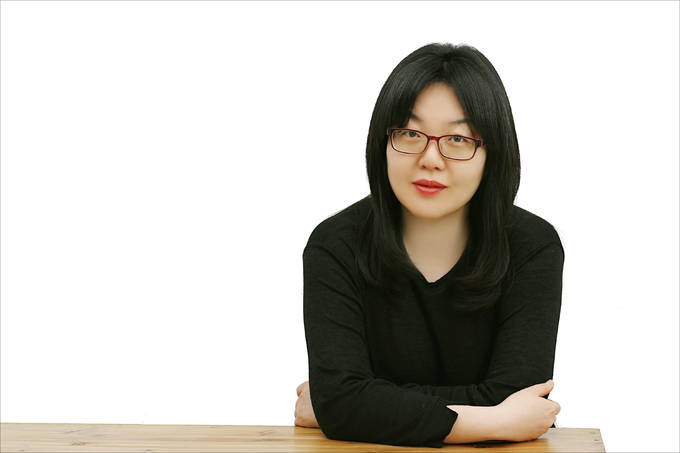
독하게 일했다. 정치부 기자로 6년을 일하면서 40대에 정치부장, 50대에 편집국장 타이틀을 다는 탄탄대로를 꿈꿨다. 결혼 후 난임 끝에 기적적으로 아기가 찾아오고, 아기집이 두 개란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쾌재를 불렀다. 서로 다른 아기집을 갖고 태어난 아기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면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두 아이의 발달은 전혀 달랐다. 딸 수인은 말을 하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아들 동환은 돌이 지나도록 뒤집기조차 못했다. “조금 늦나보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불안감이 커졌다. 결국 발달장애 확진을 받은 날, 남편은 “내 인생이 끝났다”고 했다.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직해 청와대를 출입하겠다며 야심찬 계획을 세워놨던 그녀의 꿈도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전직 아시아투데이 기자이자 현직 장애아이 엄마’ 류승연 작가 얘기다.
이제 그녀는 기사 대신 책과 칼럼을 쓰고, 강의를 하러 다닌다. 지난 봄,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담은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을 펴냈고, 가을에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희망하며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를 펴냈다. 지난 10월부터는 한국일보에 ‘장애아 엄마, 세상에 외치다’란 주제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제외하면 “무언가를 쓰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글은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도피처다. 아이가 장애 확진을 받고 “내 삶은 없다”는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져 몇 년간 뉴스조차 보지 않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 살아가던 어느 날, 볼펜을 들고 벽지에 글을 쓰고 있던 자신을 발견했다. 그제야 “나는 ‘쓰는 사람’이었구나” 생각했다. 작은 인터넷 매체에 ‘아주머니’란 제목으로 일상 이야기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1주일에 한 편씩 미친 듯이 썼어요. 쓰고 싶은 모든 것을 풀어내고 나니까 일상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일만 늘었는데도, 그게 즐거웠어요.”
글쓰기가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에서 사회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더퍼스트미디어란 곳에 ‘동네 바보 형’을 연재하면서부터였다. 처음엔 단순히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 알기만 해도 달라질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는 ‘장판(장애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장애가 아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데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거죠. 장애가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해야 할 일과 사명감도 또렷해졌어요.”
장애란 사전적 의미로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뜻한다. 류 작가가 ‘장애아이 엄마’를 선택한 것이 아니듯, 누구도 원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장애인이 되어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손, 발이 없거나 발달장애 같은 특이한 것만 장애로 인식하잖아요. 이것부터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글쓰기, 강연, 인터뷰, 부모 교육과 스터디까지. 현직 기자인 남편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30~40년 뒤 죽을 때 아이를 데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다. 아들을 일반 초등학교에 보내고 심하게 마음고생을 하던 2년 전, 남편과 둘 중 하나가 병에 걸려 죽게 되면 ‘아이랑 셋이 같이 가자’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웠다. 부부가 없을 때 그 짐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할 딸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발달장애아 부모들 중에는 아이를 죽이고 뒤따라 죽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아이는 크게 바뀌지 않아요. 아이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힘들어도 이 일을 계속 하는 이유예요.”
대치동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정치부 기자 시절엔 6년간 국회를 출입하면서 매일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는 이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가 어설프게나마 ‘팔뚝질’도 한다. ‘장판’의 사람들을 만나 취재를 하고 교육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에게 따져 물을 때는 독종 기자 시절의 ‘성격’이 나온다.
하지만 역시 혼자서는 힘에 부친다고 그는 말했다. 습관처럼 “함께 하자”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다. “아이에 관한 글만 쓰면 편해요. 사람들이 책도 내자고 하고, 공감 이메일도 받고요. 하지만 사회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 알리기 시작하니 욕도 먹고, 악플도 달려요.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죠. 저 말고도 기자 출신 중에 장애아를 둔 부모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장애랑 감기랑 살은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아요. 숨어 있는 누군가가 나와서 꼭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합시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