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진급 앞두고 귀농… 멸종 위기 '토종 라일락' 7종 보존
[기자 그 후] (5) 김판수 정향나무농장 대표 (전 경향신문 기자)
기자생활 20년이 다가오면 슬슬 현장을 떠나야 한다. 후배가 쓴 기사를 회사에 앉아 가다듬는, 데스크가 되는 시기다. 전직 기자 김판수 대표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 1991년 경향신문에 입사한 그는 17년차였던 2007년 홀연히 신문사를 떠났다. 부장 진급을 눈앞에 뒀던 때였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피맛골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퇴사 이후 10년 만에 와본다는 그는 옛 상가들이 헐린 자리에 들어선 고층건물을 보며 “많이 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종하면 축하하러 낙종하면 위로하러 피맛골, 청진동 가서 술 참 많이 마셨다”며 “그때 먹었던 매콤한 낙지볶음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나서 여기서 만나자고 했다”고 웃었다.

새빨간 낙지에 술잔을 기울이다 10년 전 회사를 나온 이유부터 물었다. “데스킹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당시 차장일 때도 데스킹 업무를 좀 했거든요. 회사에 가만히 앉아서 후배들 기사 보는 게 고역이었어요. 역마살 있는 놈이라 계속 현장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거면 그만두자는 생각이었어요.”
퇴사한 그해 가을 귀농했다. 충북 단양군 소백산 기슭에 터를 잡았다. 거기서 ‘정향나무 농장’을 시작했다. 정향나무 등 멸종위기종인 토종 라일락 7종을 키워냈고 사상 처음 대량 증식에도 성공했다.
김 대표는 “기자 경험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고 했다. 기자 초년병시절 환경을 담당하다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 라일락의 슬픔을 접했다. 정향나무에 관심을 쏟게 된 계기였다. “1947년 미군정 때 정향나무가 미국으로 넘어가 미스김라일락이라는 품종으로 개량됐어요. 미스김라일락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비싼 값에 역수입되고 있는데 원종인 토종 라일락은 멸종위기라니. 이거 종자 수탈 아닌가요?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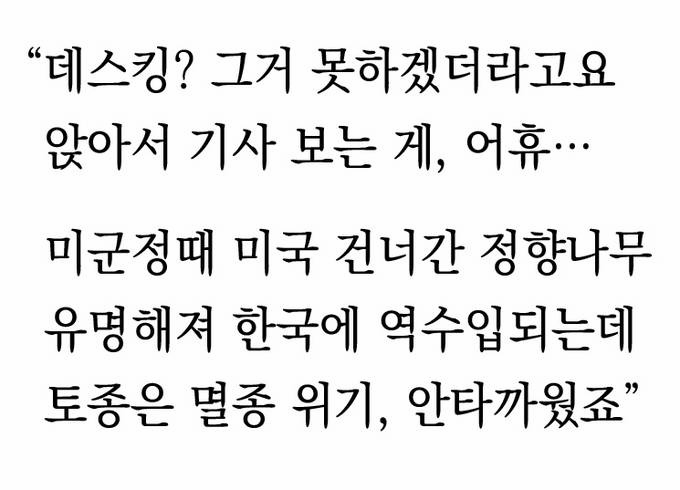
이후 1996년 취재차 설악산을 찾았다가 정향나무를 발견하고 씨앗 100개를 가져왔다. 그 다음해 낚시하러 자주 다녔던 남한강변에 씨를 뿌렸다. 이중 9개에서 새싹이 돋았다. 한 그루가 죽고 8그루가 남아 무럭무럭 커나갔다. 10년 뒤 농장으로 옮겨 정성스레 키웠다. 다시 10년이 흐른 지금 농장 2000여평엔 정향나무뿐 아니라 흰정향나무, 꽃개회나무, 섬개회나무, 수수꽃다리 등 2만6000여 그루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는 나무가 담긴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식물학자들도 토종 라일락 7종을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전기도 수도도 없는 농막에서 수년간 먹고 자며 고생한 결과다. 이제야 서울집에 오는 날도 많아졌다. 농장 운영 초기엔 노심초사하며 소백산을 쉽사리 떠나지 못했다.
“우여곡절 많았는데 시간이 흘러 나무의 생태습성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애들(나무들)이 긴장해서 안 자라요. 햇볕, 바람, 비가 애들을 키운다니까요.”
10년간 모든 걸 쏟아 부은 일이지만 캄캄한 농막에 누워있으면 가끔 ‘그만 안 뒀다면 어땠을까’란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곧바로 고개를 가로 젓는단다. “현장이 좋긴 했어도 매일 마감에 쫓기며 살았어요. 일 그만두고 나니 내가 얼마나 게으른 놈인지 알게 되던데요. 젊었으니까 했지 지금은 하라고 해도 못해요. 다만 어려운 환경에서 언론인으로서 정도를 지키려 노력하는 동기들을 떠올리면 나 혼자 맘 편히 사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김 대표는 언론사 퇴사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직도 스스로를 기자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토종 라일락 복원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제가 사회부를 오래 했거든요. 사회부 기자의 역할은 약자들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위해 목소리 내는 것 아닙니까? 인간을 넘어 외연을 확장한 거죠. 멸종위기 식물로 기자의 눈을 넓힌 겁니다. 기사만 안 썼지 제 생활은 기자와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기자는 기사뿐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