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강변했다. 변론이 시작된 지 7시간여 만에 나타나 77페이지짜리 최후 진술서를 67분간 읽어 내려간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로 사과를 갈음했으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날 오후 10시를 넘겨서 끝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26일자 아침 신문 1면에 담겼다. 다만 신문마다 주목한 포인트가 달랐다. 경향신문과 동아·한국일보는 반성이나 승복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세계·조선·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서울신문은 윤 대통령 주장과 국회 측 최종 변론을 나란히 실었다. 한겨레는 파면을 촉구하는 국회 쪽 입장을 제목으로 뽑았다.

다음은 26일 아침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윤석열, 최후까지 반성은 없었다>
국민일보 <尹의 최종진술 “계엄은 대국민 호소”>
동아일보 <계엄선포 사과도 승복 언급도 없었다>
서울신문 <尹 “임기단축 개헌” 국회 측 “반헌법적 도발”>
세계일보 <尹 “직무 복귀하면 임기 연연 않고 개헌 추진”>
조선일보 <“계엄은 야당 때문…복귀 시 임기 연연 않겠다”>
중앙일보 <윤 “임기 연연 않겠다” 임기단축 개헌 표명>
한겨레 <국회쪽 “윤석열 반역행위자” 파면 촉구>
한국일보 <尹 “임기단축 개헌” 승복 메시지 없었다>

사설에선 더 직접적인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최종진술을 두고 “망발” “망상” “기가 막힌다” “참담하다” “파렴치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음은 관련 사설 제목.
경향신문 <내란 사과 없이 ‘복귀 망상’까지 드러낸 윤석열의 최후진술>
국민일보 <계엄 정당성 강변한 尹 최후 진술… 이제 헌재의 시간>
동아일보 <尹 헌재 최후진술… 끝내 달라진 건 없었다>
서울신문 <尹 탄핵심판 변론 끝… 이젠 갈등 접고 승복 다짐을>
세계일보 <최후진술까지 승복 언급 없이 계엄 정당성 강변한 尹>
조선일보 <대통령·민주당은 “어떤 결과든 승복” 밝혀야>
중앙일보 <최후진술까지 통합 외면한 윤 대통령 실망스럽다>
한겨레 <끝까지 반성·사과 없는 윤석열, 파면해야 한다>
한국일보 <‘국가·국민 위한 계엄’이라니… 尹 최후진술 참담하다>

경향신문은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망상으로 국민들 염장을 질렀다”며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대통령직 복귀까지 거론하다니, 뻔뻔하다 못해 파렴치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의 최후진술은 윤석열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지적한 뒤 “이번 탄핵 심판은 대통령 한 사람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독선적 권력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기본권을 침해해도 되는 나라인지, 그럴 수 없는 나라인지 결정하는 역사적인 심판”이라며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해 자유민주적 가치와 헌정질서 수호의 이정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비상계엄 이후 국가적 손실과 국민적 상처에 비춰 보면 자성과 뉘우침은 여전히 미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약속은 물론이고 지지 세력을 향해 승복을 당부하는 발언조차 없었던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만큼은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면서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며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경제·민생이 어려워지고 나라는 탄핵 찬반으로 갈려 두 쪽이 났는데 지지층만 챙기는 것은 일개 정파의 지도자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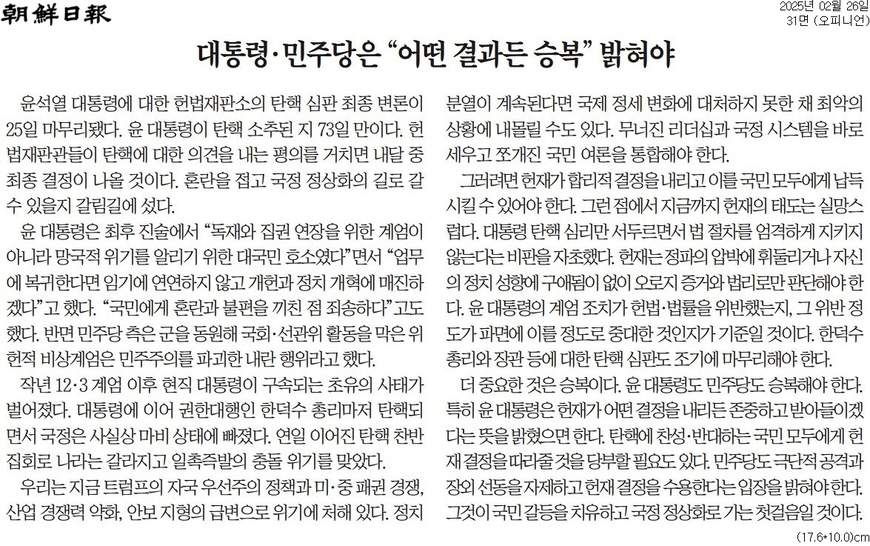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제 헌재의 시간만 남았다. 신문들은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릴 것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더 중요한 것은 승복”이라며 “윤 대통령도 민주당도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헌재 선고 임박, 긴장 고조... 기자 안전대책 마련돼있나 (2025/02/25)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