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평웹진 ‘게임제너레이션’(GG)이 지난 2월 내놓은 웹진 4호엔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동숲)과 관련해 이런 글이 실렸다. “표면적으로는 대자연 속의 힐링, 복잡한 도시를 떠난 무인도에서의 맑고 아름다운 삶을 제시하지만” “금융자본주의의 핵심이 뼈대에 자리한 대출구조를 통해 연출된다.” 무인도에서 낚시와 채집을 하고, 텐트를 번듯한 나만의 집으로 확장하고 꾸미는 ‘힐링게임’을 이경혁 GG 편집장은 이렇게 바라봤다. 나아가 “우리가 늘 동경하고 욕망하는, 세계의 짜여진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 욕망을 포착하고 만들어낸 상품일 뿐”이며 동숲의 공간은 “사이버공간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스타필드’”일 수 있다는 분석이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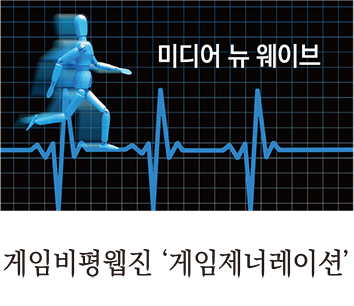
일상의 여흥으로 게임을 대하는 많은 이들에겐 낯설겠지만 게임비평은 있다. 영화를 ‘재미’ 이상의 예술로 여기듯 게임도 그리 볼 수 있다는 태도의 글. 그러니까 게임비평웹진 GG는 ‘스타크래프트’와 ‘LOL’의 유행에서 시대별 세대론을 살피고, 도시 운영 게임 ‘심시티’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보이지 않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콘텐츠를 내놓는 매체다. 이 편집장은 지난 14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영화가 ‘방화’(국산영화)로 불리던 시절 영화담론은 없었다. 이만큼이 된 덴 ‘키노’나 ‘씨네21’ 같은 잡지 공이 컸다고 생각한다. 게임도 그걸 갖고 싶지만 게시판에서 하는 욕으론 달성이 안 된다. 일종의 전위로서 맨 앞에서 이야기를 던지는 역할이 필요하다. 게임을 문화로 만드는 건 ‘게임은 문화다’란 선언이 아니라 삶속에서 계속 얘기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창간호를 낸 잡지는 “먼훗날 최초의 게임 세대(Game Generation)로 일컬어질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고 밝힌 이후 지난 9개월 간 격월로 5개호 웹진을 선보였다. 매체명은 플레이어가 게임승패를 승복하는 순간 채팅창에 쓰는 문구(Good Game)와 같은 두문자어이기도 하다. 당위는 알겠지만 “웹진보다 무겁게, 학술지보다 가볍게”, “게이머이자 인문사회 교양 지식을 갖춘 이들의 교집합”, “매스라고 부를 독자 덩어리가 만들어지긴 쉽지 않고 적은 숫자를 키우는 게 목표”라는 매체는 가능한가. 심지어 잡지는 오프라인 인쇄를 하지 않고 구독료도 없다. 모든 콘텐츠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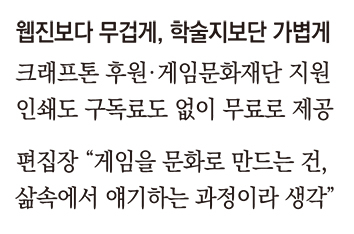
GG는 ‘배틀그라운드’로 잘 알려진 게임회사 크래프톤의 후원, 게임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계기는 지난해 3월 대학원 박사과정 지도교수의 갑작스런 연락으로 크래프톤 관계자와 만난 자리였다. 게임 칼럼니스트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틈날 때마다 게임비평매체 운영의사를 밝혀온 그는 이날 ‘게임을 문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쪽에 후원할 생각’이란 말을 듣고 반겼다. 지정 기부처로 게임문화재단이 결정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지난해 6월 창간이 확정됐고 현재까지 운영되는 상태다. 그는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신(scene) 자체의 위상을 올려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국내 게임사가 눈을 돌릴 수 있고, 수익 생각 없이 ‘문화’에 이만큼 기부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측면이 있다”며 “구독모델을 꿈꾸긴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산업의 후원을 택한 거고 지금으로선 추가 후원처를 찾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렇게 매체는 ‘집중기획’(커버 스토리), ‘TRENDS’(게임·기술 관련 뉴스) ‘ARTICLES’(비평, 인터뷰) 등 한 호당 20개 안팎의 글로 채워진 잡지를 내놓는다. 콘텐츠는 편집장 1인과 외부 필자의 글로 나뉜다. 따로 기자나 에디터가 없는 1인 매체에 가깝다. 격월로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총 5인)들이 일부 역할을 거들지만 편집장이 콘텐츠 취재와 작성, 섭외, 웹진 편집, SNS 운영, 홈페이지 관리 등에 전부 관여한다. 비용 대부분은 외부 필자의 원고료, 해외 필자의 번역료에 사용한다. 게임에 대한 한 개인과 기업의 공통된 바람이 공명하며 창간이 가능했지만 후원처가 한 곳에 불과하고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점은 매체 장기존속에 불안요소이기도 하다.
“신(scene)의 구축”이란 목표 아래 이제 막 첫 발을 뗀 매체의 지난 1년여 간 최고 소득은 그간 모은 사람들이다. 현재 국내·외를 통틀어 60~80명의 필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최근 공지해 앞으로 매년 정례 개최할 예정인 게임비평공모전 역시 이런 맥락에서 준비됐다. 단기 목표론 ‘영문판 발간’을 구상 중이다. 타국의 게임문화 담론을 봐도 우리가 제일 잘하는데 잘 전달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를 통해 “게임문화담론을 얘기할 때 한국의 이 잡지를 봐야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는 것. 안락한 정규직 자리를 거쳐 굳이 계속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는 그에게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다. 오페라 공연 기획, 인터넷서점 마케터, 신용평가사 등 15년을 직장인으로 살아온 그는 현재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으며 강의와 연구를 한다. 1년에 한 권씩은 책을 내왔고 최근엔 다큐 제작에도 참여 중이다.
“‘아무도 안하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소명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제가 잘해야겠지만 못할 때 대체할 두 번째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신(scene)을 구축하는 게 제 목표다. 이걸로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일정 수 이상 정규직 종사자가 버틸 수 있도록 밭을 넓히고 구조를 만드는 게 완성일 것 같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