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 내 실내 체육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을 뛰어넘어 정부가 아예 전 국민 강제 자가격리를 명령하면 어떨까. 지금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가 적잖은데 불만이 폭발하지 않을까. 놀랍게도 실제 56일 동안 집 안에 갇혀 살았던 이가 있다. 바로 프랑스에 살고 있는 정상필 전 광주일보 기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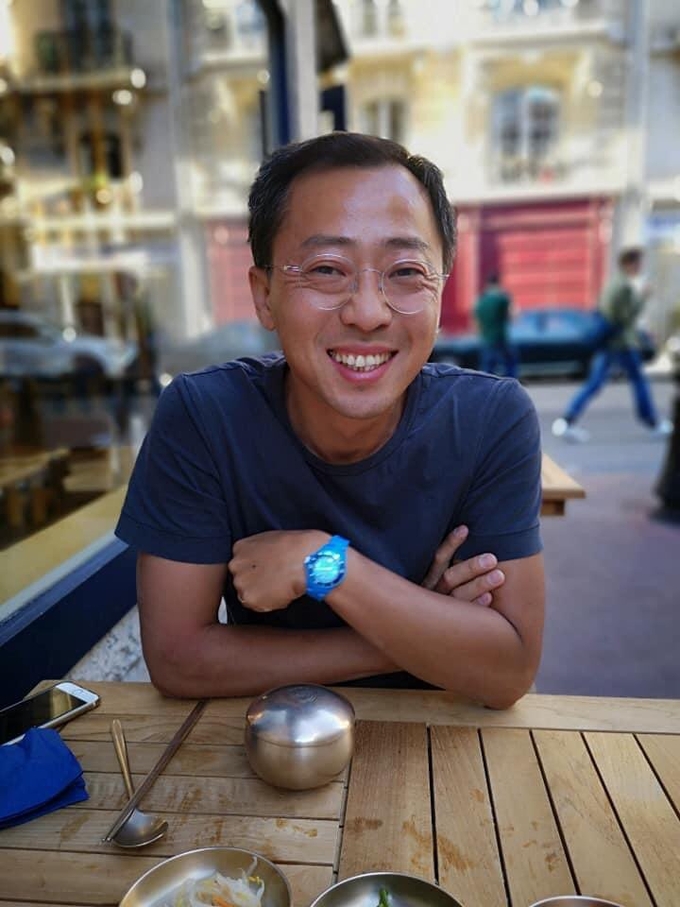
▲정상필 전 광주일보 기자.
정상필 전 기자는 전남 구례 출생으로 프랑스와는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전공이었던 불문과가 재밌어져 파리에 유학을 가게 됐고 그렇게 파리8대학에서 학사 졸업까지 했다. 기자를 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으로 들어와 2004년부터 6년여 간 광주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지만 당시 광주에 자원봉사를 온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고, 프랑스인이었던 아내를 배려해 신혼살림을 파리에서 차리면서 자연스레 기자직을 그만두게 됐다.
현재 그는 프랑스 중부에 위치한 인구 4만5000명 정도의 작은 도시, 블루아에 살고 있다. 격리생활을 했던 기간은 지난 3월16일부터 5월10일까지 56일간으로 아내, 아이 넷과 함께 집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강제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인권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에서 개인의 자유를 전면 통제한다는 것이 처음엔 너무나 초현실적이어서 믿을 수 없었지만” 어떡할 것인가. 따를 수밖에.
프랑스 정부가 국민들에 내린 통행금지령은 몇 가지 예외사항이 아니면 이동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업무상 이동을 해야만 할 경우나 식료품 등 필수적인 물품을 사러 가는 경우, 또 건강상 이유로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또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만이 예외로 인정됐다. 그나마 집 근처에서 운동을 하거나 애완동물 산책을 시킬 땐 이동이 가능했지만 그것도 하루 한 차례, 최대 1시간, 집에서 1km 이내로 제한됐다.
정 전 기자는 “쉽게 말해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감옥처럼 집에 가둬놓고 한 시간 산책만 허용하는데, 실제 감옥도 한 시간 정도는 산책할 수 있지 않느냐”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집에 정원이 있어 덜 답답했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만약 집값 비싼 파리 조그만 아파트에서 6명이 함께 있었다면 “돌아버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는 잔디 깎기와 가지치기 등 정원 가꾸기를 하거나 첫째아이 방의 페인트를 칠하며 시간을 보내는 데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오전, 오후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아내와 커피를 마시며 보드게임을 하는 삶에서 행복도 느꼈다. 유례없는 코로나 브레이크 기간을 기록하기 위해 격리 초반부터 꾸준히 일기도 썼다.
그러나 가장 특별하게 금지된 것,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아예 사라졌다는 사실은 특히 그를 힘들게 했다. 정 전 기자는 “가족 아닌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격리 생활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며 “아이들이 시골에 가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지낼 수 없고, 이 도시에 사는 다른 친구들을 전혀 만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종종 어딘가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발코니에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이탈리아 시민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야말로 전에 누렸던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정상필 전 광주일보 기자가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날, 격리 해제 기념으로 정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럴수록 그는 더욱 가족, 부부, 육아, 행복이라는 단어에 집중했다. 이달에 각각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1학년으로 올라가는 세 아이들과 만 16개월이 된 넷째까지 돌보려다 짜증과 분노가 일었던 적도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함께 붙어 지낸 시간만큼 가족이 단단해졌음을 느꼈다. 너무나 개인적인 일기를 최근 <세상이 멈추자 일기장을 열었다>라는 책으로 출간한 것도 자신과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아이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정 전 기자는 “고백하건대 나는 가족의 의미를, 결혼을 하고 스스로 가족을 꾸린 뒤에야 새롭게 알아가고 있다”며 “다 가족 덕”이라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