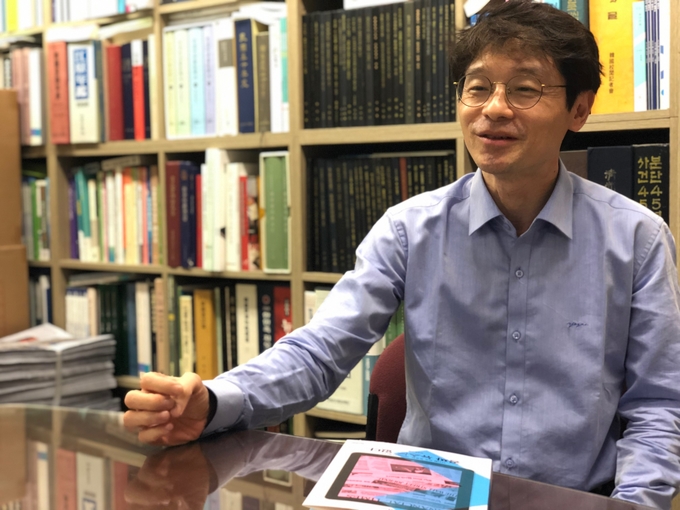
권태호<큰 사진> 한겨레신문 출판국장이 최근 낸 책 <공짜 뉴스는 없다>는 “좋은 기사에는 비용이 든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내야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 당연한 말은 간과되고 있다. 포털창을 열면, SNS에 들어가면, 언론사 사이트를 찾아가면, 뉴스는 공짜다. 뉴스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는데 비용은 회수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 권 국장이 책 머리말 말미, 마지막까지 뺄까말까를 조심스레 고민하던 문장은 이렇다. “혹 이 책을 보신다면, 어떤 형태로든 뉴스에 돈을 지불하는 경험을 해볼 것을 권한다.”
 요즘 같은 시기 언론인은 이 말을 하기 참 어렵다. 권 국장도 면구스러운 일이란 걸 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기자협회보와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가 돈을 낼 수준의 뉴스를 생산하는지, 제대로 된 물건을 내놓고 ‘사가세요’가 아니라 ‘일단 돈을 주면 좋은 거 만들게요’가 맞는 건지 갈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뉴스나 언론 욕만 한다고 달라지진 않는다. 언론사 물적 토대가 약해지면 기형적인 행태로 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뉴스에 비용 지불하는 게) 익숙지 않았는데 이게 해결되면 퀄리티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요즘 같은 시기 언론인은 이 말을 하기 참 어렵다. 권 국장도 면구스러운 일이란 걸 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기자협회보와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가 돈을 낼 수준의 뉴스를 생산하는지, 제대로 된 물건을 내놓고 ‘사가세요’가 아니라 ‘일단 돈을 주면 좋은 거 만들게요’가 맞는 건지 갈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뉴스나 언론 욕만 한다고 달라지진 않는다. 언론사 물적 토대가 약해지면 기형적인 행태로 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뉴스에 비용 지불하는 게) 익숙지 않았는데 이게 해결되면 퀄리티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책은 앞선 메시지 위에 차곡차곡 그간 언론사들의 유료화 시도를 쌓아놓는다. 뉴스통신진흥회 출판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집필된 책은 윤리규범서가 아닌 연구서로서 ‘디지털 뉴스 유료화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조명한다. 유료화를 정착시킨 영미·유럽권 언론사, 고심 중인 국내 매체들의 시도는 그 방식과 성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됐고, 실무자나 대표 등 인터뷰 역시 다수 담겼다. ‘디지털 뉴스 유료화’에 대한 교과서라 할만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권 국장은 답 없는 뉴스 유료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었을까. 그는 “‘한국 언론사는 어떻게 해야돼?’라고 하면 ‘막막하다’”고 답했다. “언론 매체들이 과도한 정파성의 유혹 속에 원인 제공을 하며 논증 시장이 뒤틀리고, 포털의 언론시장 지배” 등은 뉴스 유료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여기서 언론들이 해야 하는 것은 수많은 작은 실험들이라고 그는 말한다. “(후배들이) 시도하는 걸 경영진, 간부들이 북돋아주고 판을 깔아줬으면 한다. 큰 실패는 무조건 성공을 안 하면 안 되게 하고 다음엔 완전히 접게 만든다. 그럼 두 번 다시 못하게 된다. 10개 중 9개는 실패하고 1개는 될까 말까 할 텐데 소소한 실패를 여러 번 하도록, 그래서 실패의 경험이 축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천생 신문기자인 그는 2015년 10월 디지털에디터 발령으로 처음 디지털에 실전 입문했고, 언론대학원 진학 등으로 관심을 이어왔다. 1993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 한겨레21, 경제부, 정치부 기자로 일했다. 워싱턴특파원, 정치부장, 국제에디터, 디지털 에디터, 논설위원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출판국장을 맡고 있다. 올 초 후원제를 도입한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그의 예하다. 시행 6개월 가량이 지난 현재 정기후원자는 300여명으로 용도와 후원자에 대한 리워드, 홍보방법 등을 고심 중이다.
“기존 한겨레21 매출에 대면 올해 전체 예상후원금은 1%정도다. 상징적인 수준이지만 이 돈을 취재지원에 쓴다면 매출이 줄어도 기사 퀄리티 훼손은 막을 수 있지 않겠나…(중략)…언론사들이 실패 경험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할머니 된장비법’처럼 꼭꼭 숨길 게 아니라. 매체 가치 지향과 상관없이 매체를 운영하며 느끼는 어려움은 공통이지 않나.”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최승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