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를 시도한다는 건 오늘 당장 피곤해지는 일이다. 디지털 퍼스트 역시 마찬가지다. 시도를 하는 순간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불안감은 가중된다. 무한한 책임이 누군가에게 ‘튀기도’ 한다. 그래서 어느 누가 부단히 시비를 걸고 긴장을 주입하지 않으면 혁신이 멈추는 건 한 순간이다. 시도, 실험, 혁신은 그렇기에 어렵다.
임인택 한겨레 기자 역시 오늘 당장 피곤해지는 삶과 먼 쪽에 있었다. ‘얼리 어답터’도 아닐 뿐더러 싸이월드나 트위터조차 제대로 해본 적 없던 그는 탐사보도팀에 몇 차례 몸담으며 전통적 저널리즘의 영역인 탐사보도에 주력해왔다. 그런데 지난 4월 그의 일신에 변화가 생겼다. 탐사보도, 디지털 특화 콘텐츠 제작 등 여러 역할을 부여받은 ‘디스커버팀’의 팀장이 된 것이다. “디지털 특화 콘텐츠 만들기라는 숙제가 느닷없이 생긴 거죠. 팀은 자연스레 탐사보도로 수렴됐지만 계속 고민이 가던 차였는데 부장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KPF 디플로마 과정에 가보라고 했어요.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라는 주제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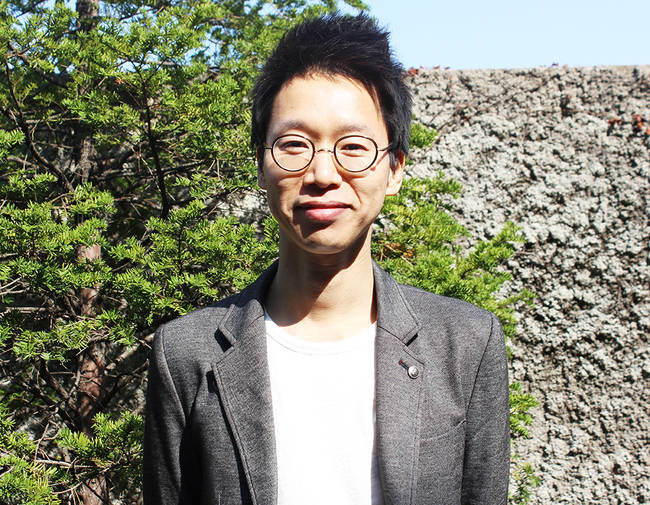
사실 그 역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독자들이 기사를 읽게 할 수 있을지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2015년 아동학대 문제나 지난 5월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에 많은 품을 들여 탐사보도를 했지만 잘 읽히지 않았던 것이다. “‘기자는 아무리 취재해도 쓰지 않으면 취재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고, 아무리 잘 써도 시민이 읽지 않으면 쓰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들여 쓴 기사가 안 읽히니 아찔했습니다. 패배주의적 생각으로 기록 저널리즘이라도 하자면서 자위했지만 내심 외국에는 어떤 실험값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지난 1~12일 추석 연휴를 관통하는 기간, 그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워싱턴포스트, AP통신 등 미국 유수의 언론사를 방문했다. 제한적으로 보고 들은 정보였지만 확실히 국내 언론사와 격차가 느껴졌다. “우선 돈과 아이디어 자원이 풍부했어요. 기술이 되니 미디어로 실험하는 과정도 많았죠. 미국 기자라고 디지털 격변기에 고민이 없을 순 없었을 텐데 앉아서 고민만 하기보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도들을 했더라고요. 저널리즘 앞에 별의별 말이 많이 붙어있었는데 그만큼 촘촘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워싱턴포스트(WP)였다. 꽤 오래 전부터 프론트 페이지(1면)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는 WP의 아침 회의 풍경은 색다르게 다가왔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탐사보도센터(CIR) 역시 흥미로웠다. “전통 저널리즘에 가까운 탐사보도 기자들이 디지털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궁금했는데, 가서 보니 펜 기자가 코딩도 할 줄 알고 그래픽도 다루고 빅데이터 처리도 하는 등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나이 든 기자들도 예외 없이 모두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들이었죠.”
디지털 테크닉까지야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 언론 역시 기자들에게 꾸준히 멀티태스킹을 강조해왔다. 임 기자 역시 2003년 입사한 해부터 직접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에는 회사에서 나눠준 캠코더로 영상을 찍어 붙여야 했다. 그 역사는 블로그, 트위터, 디지털 선출고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계가 명확했다. “뉴욕대 미래학자인 에이미 웹 교수가 말했듯 그런 지시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고작 당면한 1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5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충분한 위기의식이 공유되지 않고 있었죠. 디지털 전환이 잘 안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가 연수 기간 한겨레 온라인에 연재한 ‘디지털 문맹 기자의 서방견문록’은 결국 조직에 위기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다. “그럴 목적으로 연수 기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한두 사람의 열정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퍼스트는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조직적으로 가려면 뉴욕타임스처럼 자본과 준비된 인력이 필요한데 우린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 가장 중요한 건 위기의식을 기자 개개인이 공유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만 해도 답은 널려 있죠.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사례를 연구해 기민하게 채용하고 집중적으로 시도하는 것,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