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벼슬인가"…두 번 울리는 언론사 채용 갑질
채용 당시 약속 '나 몰라라'…항의하는 지원자엔 불이익
'너 아니어도 사람 많다' 수습기자 배짱 채용도
인턴기자에 어뷰징 업무주며 "열심히 하면…" 희망고문
합격통보 1시간 후 취소해놓고 "단순한 행정 착오" 변명
자체 시험 유료로 내놓거나 경력 반만 인정 '자사우월주의'
“처음에 입사할 때만 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큰 사고를 치거나 도덕적인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했죠.” A 기자는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이라는 채용 공고를 보고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의례적인 절차로만 여기고 이직을 결심했다. 선발된 동기들도 “당연히 정규직과 다름없다”고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평가를 앞두고 사측이 돌연 입장을 바꾸며 “채용된 기자 가운데 일부를 계약 만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이미 10달 넘게 일을 해온 상태였다.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자 사측은 일부 기자에 대해 추가로 6개월간 사쓰마와리 과정을 밟게 하고 나중에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A 기자는 “다들 경력기자로 채용된 인재들인데 평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사쓰마와리를 돌게 하는 등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나. 기자가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알았다”며 “공채 시장이 한창 찬바람이라 당당하게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언론사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기자 지망생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채용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채용갑질’ 꾹 참아야 하나요
꽁꽁 얼어붙은 채용 시장 한파 속에서 사측의 무책임한 행동이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채용할 때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언제 그랬냐는 듯 잡아떼는가 하면, 정식으로 항의하는 지원자를 노골적으로 배제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수천 명이 몰리는 수습기자 채용 과정 속에서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는 식의 ‘채용 갑질’은 청년들의 의지마저 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일간지의 인턴기자 C씨는 “최종 면접 때 주요 이슈에 관한 의견을 물을 것 같아서 준비해 갔는데 ‘주량은 어떻게 되나’는 식의 엉뚱한 질문이 쏟아져 당황스러웠다”며 “같이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접 때 외모나 학력 비하를 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도국 내에서 기자들이 하기 꺼려하는 자료조사나 소위 ‘어뷰징’ 업무를 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자 부장이 ‘열심히 하면 기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로 희망고문했다”고 하소연했다.
갑자기 불합격 통보 ‘분통’
“착오가 있어서 합격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회사 한 곳의 아마추어적인 행정 처리일 뿐이겠지만 이제는 언론 자체에 정나미가 다 떨어지네요. 오랫동안 꾼 꿈인데 이제는 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한 기자지망생도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언론인을 꿈꾸는 카페-아랑>을 통해 언론사 채용 시스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1시간 후에 취소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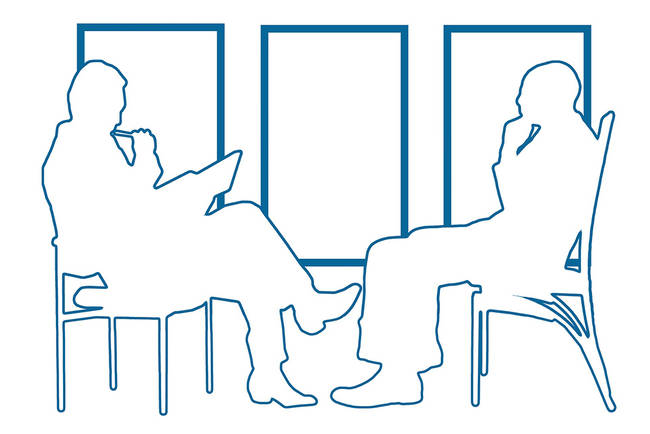
또 다른 지원자에게는 “책임감을 보겠다”는 이유로 면접 2시간 전에 추가 면접을 통보한 후 취소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해당 언론사로 지목된 뉴시스는 사건이 알려지자 즉각 사과했다. 경제지의 한 기자는 “부당한 경험을 해도 구직자 입장에서는 평판이 좋지 않게 퍼질까 두려워 폭로하기 쉽지 않다”며 “일부 언론사들은 자체 시험을 유료로 내놓으며 지원자들의 호주머니를 공략하기도 한다. 입사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내고 시험 보는 일도 많다”고 꼬집었다.
경력은 반만 인정해주는 게 당연?
경력 기자를 선발할 때도 채용 과정의 한계가 제기된다. 특히 주요 언론사로 이직을 할 때 기존 경력의 반만 인정하는 관례를 두고 ‘자사우월주의’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다. 올해 초 일간지로 이직한 한 기자는 “원래 차장급이 넘는 연차이지만 이직 후 주니어 후배보다도 더 아래 연차가 됐다”며 “옮기는 입장에서야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함께 일하는 선배들은 불편해할 것 같다”고 했다.
대개 스카우트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력 기자의 ‘깜깜이’ 채용 방식도 지적을 받는다. 출입처에 생소한 얼굴이 등장할 때마다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 학연과 지연 등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흘러나온다. 한 일간지의 온라인 기자는 “누구의 아들, 딸이라는 소문은 기본이고, 윗선에서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는데 들러리를 세우기 위해 공개 채용을 했다는 소문마저 나온다”며 “신입뿐만 아니라 경력 채용을 할 때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구직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