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자상] 2021년 청소년 트렌스젠더 보고서
[제376회 이달의 기자상] 김주연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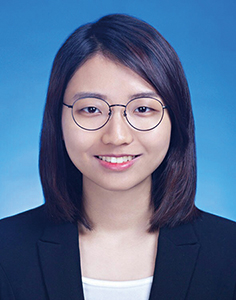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전하려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건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었다. 막막하던 와중에 처음 연락을 준 사람이 바로 수민(가명)씨였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며 메일을 보내온 그를 반갑게 만나러 간 날 우리는 그가 가족과 학교 어느 곳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오랜 시간 묵묵히 삶의 무게와 어려움에 대해 토로한 수민씨는 “저와 같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해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수민씨를 시작으로 여러 청소년들을 만났고 4개월 뒤 본격적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수민씨가 폐쇄병동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는 얘길 들었다. 그는 “병원 안에서도 공고하던 성별 이분법을 타파하고 싶다”고 알려왔다. 마음이 쓰라렸다. 혹여 기사 때문에 수민씨의 건강이 악화되진 않을까 걱정이 됐다. 회의를 거듭하며 문장을 다듬었고 기사가 출고됐다. 기사를 본 수민씨의 말에 비로소 안도했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기사가 나와서 기뻤다.”
전국에서 만난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앞에 놓인 산은 여전히 공고하다. 성 정체성에 맞는 신분증 하나를 얻기 위해 힘겨운 성별정정 과정을 거치고,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고된 알바를 이어간다. 차별금지법은 15년째 표류 중이다. 언론은 왜 이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일찍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너무 늦은 기사가 아니기를 바라며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