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입국' 최초·연속 보도
[제334회 이달의 기자상] 제주신보 좌동철 기자 / 지역 취재보도부문
지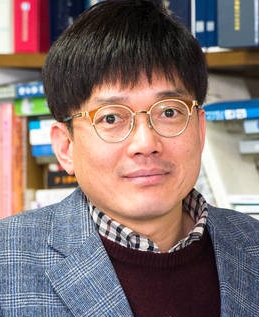 난 4월 말이었다. 잊어버릴 만하면 연락을 하며 소주잔을 기울였던 중학교 동창생이 하는 말이 생뚱맞았다. 동창생은 모 항공사 직원으로 제주국제공항 카운터에서 근무한다. “예멘이라는 나라 알고 있냐?…중동에 있는 것 같은데…얘네들이 요즘 80명씩 들어온다…뭐, 예멘사람들이 제주에 온다고?…출입국 쪽에선 골치가 아픈 것 닮아.”
난 4월 말이었다. 잊어버릴 만하면 연락을 하며 소주잔을 기울였던 중학교 동창생이 하는 말이 생뚱맞았다. 동창생은 모 항공사 직원으로 제주국제공항 카운터에서 근무한다. “예멘이라는 나라 알고 있냐?…중동에 있는 것 같은데…얘네들이 요즘 80명씩 들어온다…뭐, 예멘사람들이 제주에 온다고?…출입국 쪽에선 골치가 아픈 것 닮아.”
예멘을 검색해보니 내전을 치르고 있다는 기사가 떴지만 감(感)이 잡히지 않았다. 간신히 난민 신청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실을 알아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물어보며 본격 취재에 들어갔다.
지난 5월 3일자 제주신보 1면에 ‘3년 넘게 내전이 한창인 중동 예멘인 78명 제주공항에 왜?’라는 제목 하에 이들의 입국 사실을 국내 언론에선 처음 보도하게 됐다. 처음엔 매일 입국하는 예멘인들의 통계는 물론 난민 심사 절차와 체류 문제 등 기초적인 사실부터 확인이 어려웠다. 제주출국입국에 있는 난민 심사관은 1명이었고, 제주도에 아랍어 전공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멘인들이 탑승한 항공기가 도착할 때마다 부산에서 아랍어 통역사를 불러와야 했다.
5월 초 기사를 썼지만 반응은 미지근했다. 최빈국에서 온 이들의 거주와 생계와 관련, 문제가 터질 것이라 직감했는데 후속 보도가 녹록지 않았다. 제주도민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었다. 운이 따랐는지 예멘인 120명이 중저가 호텔을 통째로 빌려 거주하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 달간 이들과 어울렸던 호텔 사장의 ‘실용 영어’와 포털사이트의 한글↔아랍어 번역기 덕분에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5월 24일자 신문에 르포 기사를 낼 수 있었다. 6월에 접어들면서 중앙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멘 난민 사태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다.
제보를 해준 중학교 동창과 난민 업무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도 귀찮은 내색 없이 사실관계를 잘 설명해준 제주출입국 직원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하고 싶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원을 해 준 김대영 편집국장과 연속 보도에 힘을 실어준 홍의석 기자를 비롯해 편집국 식구들에게 수상의 영예를 돌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