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워싱턴의 흑인노예 318명
[글로벌 리포트 | 미국]손제민 경향신문 워싱턴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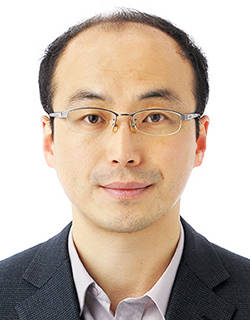 미국 워싱턴에서 차로 포토맥 강을 건너 남쪽으로 20분 정도 가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살았던 집이 있는 마운트 버논이 나온다. 지난 주말 가족과 이 국가 사적지를 찾았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워싱턴이 기거했던 저택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된 방이 21개 있는 대저택이었다. 보채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부는 기다리는 것이 여의치 않아 저택 주변을 먼저 둘러보기로 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차로 포토맥 강을 건너 남쪽으로 20분 정도 가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살았던 집이 있는 마운트 버논이 나온다. 지난 주말 가족과 이 국가 사적지를 찾았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워싱턴이 기거했던 저택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된 방이 21개 있는 대저택이었다. 보채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부는 기다리는 것이 여의치 않아 저택 주변을 먼저 둘러보기로 했다.
대저택 주변 낮은 건물들로 향했다. ‘감독관의 숙소’를 지나자 나타난 곳은 ‘노예들의 숙소’라는 팻말이 붙은 건물이었다. 워싱턴이 1799년 죽을 당시 이 집에는 318명의 노예들이 살고 있었다는 소개와 함께 이들의 생활상이 그려져 있었다.
어두운 헛간 안에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은 침대들을 본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빠, 노예가 뭐야?” 학교에서 워싱턴이 미국의 첫번째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귀가 닳도록 듣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던 터였다.
잠시 생각한 뒤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하기 싫어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아이의 표정이 더 심각해졌다. “왜 조지 워싱턴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시켰어?” 아이에게 미국의 노예제 역사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당시에는 노예제가 당연시 됐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 노예를 없애자는 사람들이 이긴 뒤 노예들이 풀려났다’는 설명을 아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의문이다.
나 역시 절대왕정에 항의하며 자유로운 시민들의 새 국가를 세우기 위해 헌법을 기초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많은 노예들을 부렸다는 사실이 약간 놀라웠다.
 마운트 버논 공식 웹사이트를 보면 워싱턴은 11세 때 아버지로부터 노예 10명을 상속받은 뒤 기회만 닿으면 노예 수를 늘렸다. 결혼 당시 부인 마사 워싱턴이 노예 150명을 데리고 오면서 워싱턴 가(家)의 ‘재산’은 급격히 늘어났다.
마운트 버논 공식 웹사이트를 보면 워싱턴은 11세 때 아버지로부터 노예 10명을 상속받은 뒤 기회만 닿으면 노예 수를 늘렸다. 결혼 당시 부인 마사 워싱턴이 노예 150명을 데리고 오면서 워싱턴 가(家)의 ‘재산’은 급격히 늘어났다.
1789년 초대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는 계속 노예를 부렸다. 마운트 버논 측은 워싱턴이 주변 다른 농장주들에 비해 노예들을 가혹하게 다뤘다는 기록과 노예들을 인간적으로 대했다는 기록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특히 그가 노예들을 채찍으로 때리는가 하면, 가족들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 노예들을 서인도제도의 노예상들에게 팔아넘기기도 한 사례를 적시했다.
당시 미국 북부 주들에서는 이미 노예제 비판 여론이 비등해 펜실베니아주는 6개월 이상 한 곳에 머무른 노예를 풀어주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에리카 암스트롱 던바 델라웨어대 역사학과 교수가 지난 2월 ‘대통령의 날’을 맞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워싱턴은 필라델피아 집에 있던 노예들을 6개월마다 마운트 버논으로 이동시키는 편법으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비록 워싱턴이 죽기 전 유언에서 모든 노예들을 풀어주도록 했지만 그 자신과 부인이 살아 있는 동안은 노예들을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았다. 도망친 노예들도 끝까지 쫓아가 잡아오려고 했다. 그가 죽으며 노예를 풀어주도록 한 것은 재산을 물려줄 직계자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요즘도 이따금 워싱턴이 흑인 여자 노예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는 한다.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의 업적에서 노예에 대한 집착은 오점이다. 하지만 마운트 버논 관리인들이 이 어두운 역사를 고증을 거쳐 상세히 복원하고 있는 점은 되새겨볼만 하다. 그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 워싱턴의 공과를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됐으며, 훗날 노예 해방을 성취한 역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당당해진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아울러 역사적 기록에 남는 일을 했던 ‘영웅’ 뒤에 이름 없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실질적인 일을 했던 수많은 민초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계속되는 ‘현대판 노예 노동’ 등을 생각할 때 초대 대통령의 어두운 역사를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전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