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과 영상은 무한한 기회의 땅"
이근영 한겨레 디지털미디어사업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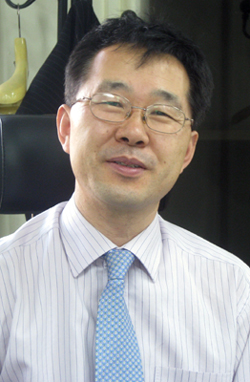 |
||
이날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황 교수를 만난 노 이사장은 줄기세포가 없고, 사이언스에 논문을 철회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방송사 기자와 인터뷰했고, 직후 김양중의 전화를 받았던 것이다. 이근영은 김양중에게 들은 대로 부르라고 한 뒤 기사를 후다닥 작성해 송고했다. 그러면서 데스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 바로 인터넷에 띄웁시다.”
“‘황우석 줄기세포 없다’ 기사가 인터넷 한겨레에 1보로 보도된 직후 신화통신 등 외신들은 한겨레를 인용해 보도했어요. 당일 저녁 긴급 방송된 MBC PD수첩 속편도 한겨레 보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마감시간에 맞춰 기사를 보냈다면 묻히는 기사가 됐겠죠. 온라인뉴스부에서 4년간 일했던 경험이 나도 모르게 축적돼 그 순간 인터넷을 떠올린 것 같아요.”
그로부터 4년 뒤, 이근영 기자는 디지털미디어사업본부장을 맡았고 ‘디지털미디어’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조직의 수장이지만 안으로 구성원을 독려하고 밖으로 콘텐츠 전략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아직 확정이 안됐다며 세부 아이템을 알려주는 데 인색했지만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한겨레 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질 것임을 확신했다.
디지털미디어사업본부는 본사와 자회사에 흩어져 있던 디지털미디어 부문을 하나의 본부로 통합한 조직으로, 웹미디어, 방송콘텐츠, 디지털사업 등 3개 부문에 구성원만 60여명에 달해 편집국 다음인 제작국과 맞먹는 규모다. 최근 리모델링된 사무실로 이전하고 팀장급 인선을 끝내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그가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한겨레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크로스 미디어(Cross Media)’다.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영상 등으로 콘텐츠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 한겨레 전문기자의 콘텐츠가 지면과 인터넷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을 통해 소비자와 만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노드 프로젝트’를 크로스미디어의 단초로 해석했다.
“한겨레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 콘텐츠의 구현을 종이신문에만 한정시킬 필요가 없죠. 콘텐츠 흐름의 방향을 신문, 잡지, 인터넷, 영상 등으로 다양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신문 기사에 영상을 붙여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제는 영상 위주의 취재도 시도할 수 있죠.”
한겨레는 다음달 중 웹TV인 ‘하니TV’를 개국할 예정이다. 웹방송을 위해 사내에 60㎡ 크기의 스튜디오도 마련했다. 이 본부장은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디지털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이 출연해 경제현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원재의 5분 경제학’, 딴지일보 총수인 김어준씨가 전하는 국제시사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실용영어 프로그램인 ‘카툰으로 배우는 파워스피킹’ 등이 제작 중이다. 뉴스의 경우 기존 방송사의 뉴스 포맷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본부장은 새로운 미디어가 기존 전통 매체를 압도하고 독자들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신문과 같은 타임테이블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합콘텐츠로 전략을 바꿔야 하고, 기자들도 취재 초기단계부터 영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런 원형을 창출하는 것이 자신의 할 일이라고 했다.
수익모델을 찾아야 하고 연봉계약직, 본사 정규직, 자회사 정규직, 단기 계약직 등 다양한 인적구조를 보이고 있는 조직을 조화롭게 리드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한겨레의 자유로운 분위기, 회사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은 천군만마다. 그는 “한겨레에는 축적된 역량을 가진 기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지만 부수가 줄어가는 신문에 갇혀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장을 웹과 영상 쪽으로 돌리면 무한한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