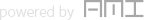조영동 편집국장은 ‘편집국장 3인 추천제’ 시행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87년 6월 항쟁 당시, 연일 계속되는 시위 때마다 시민들이 부산일보 앞을 지나갔는데 항상 돌을 던지고 가 유리창이 깨지곤 했었다. ‘관제언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고 이같은 고민은 편집권 독립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모아졌다.”
편집국장 추천제를 쟁취해냈던 88년 언론사 최초의 파업 이후 13년, 부산일보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96년 12월 김영삼 정권이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부산일보는 27일자 3면 총파업 해설기사에 ‘김정권 퇴진 부산·경남이 앞장을’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97년 1월 8일자 1면엔 위천공단 건설과 관련 ‘정권퇴진 극한투쟁 경고’라는 제목을 뽑기도 했다. 신문지면에 ‘정권퇴진’이라는 제목을 찾아보기 힘들 때였다.
당시 부산일보 노조는 날치기 통과 당일 곧바로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 이 사실을 사회면에 게재했다.
올들어 되풀이되는 언론탄압, 개혁 논란을 둘러싼 부산일보 논조와 관련해서도 홈페이지에 ‘여당 대변지’니 ‘여기가 민주당 텃밭이냐’는 식의 비난이 올라오기도 한다. 지면에 대한 평가를 떠나, 적어도 신문제작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보도 흐름은 소유, 경영, 편집 분리라는 ‘3권 분리’ 체제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리고 그 근간은 경영, 편집에 대한 재단의 불간섭과 편집국장 3인 추천제로 대표되는 편집권 독립이다.
부산일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는 사장 선임 외에 경영이나 편집에 관여하지 않는다. 88년 파업 이후 당시 재단 이사장이 ‘외부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없다’고 언급한 것도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불문율’처럼 지켜지고 있다.
오진영 상무는 “정수장학회는 장학사업을 주로 하는 목적재단이기 때문에 사장 임명권 행사 외에 간섭은 없다. 사장은 전무, 상무 등 임원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편집국장 3인 추천제는 89년 첫 선거 이래 시행 13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수차례 관련 규정을 손보면서 입사 20년 이상, 편집국을 5년 이상 떠나지 않은 간부들을 대상으로 기자들이 투표를 통해 득표순으로 3인을 추천, 회사가 편집국장을 임명하는 골자가 유지되어 왔다. 통상 최다 득표자가편집국장으로 임명된다. 현 조영동 편집국장은 초대 노조위원장으로, 이 제도를 관철시킨 장본인이다.
편집국의 한 간부는 “파업 이후, 적어도 기자가 쓰고자 하는 기사를 못쓰거나 광고 때문에 기사가 빠지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또 “최근 언론개혁 논란에 대해서도 사설이나, 칼럼, 기사 방향이 다른 경우가 있을 정도로 내부 언로가 트여 있고 이것이 그대로 지면에 반영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조영동 편집국장(1·2대), 박창호 논설위원(3대), 박병곤 부국장(4대), 이헌율 정치부장(5대), 장지태 사회부장(8대), 이춘우 편집1부장(9대) 등 역대 노조위원장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것도 이같은 풍토의 일단을 반영한다.
재단의 불간섭과 편집권 독립이 무리 없이 유지되어올 수 있었던 데 대한 부산일보 내부의 분석은, 그것이 ‘파업을 통해 쟁취한 사안’이라는 점으로 모아진다. 이전의 경우 재단을 통한 정치권의 간섭, 그에 따른 경영진의 인사, 지면 개입 등이 있었지만 88년 7월, 6일간의 파업 끝에 편집권 독립을 쟁취해냈고 이를 기점으로 재단의 간섭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편집국의 한 부장은 “독립언론을 지향하는 경향이나 문화의 경우 그것이 IMF라는 외부변화에 의해 주어진 선택이었다면 부산일보는 ‘내부동력’을 통해 현재의 체제를 닦아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쟁취한 독립’의 힘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편집국에서는 이른바 메이저 신문들의 물량공세나 ‘언론사태’에서 드러나듯 지역 정서를 외면해서도, 거기에 야합해서도 안되는 입장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편집국의 한 간부는 “부산일보가 결코 이상적인 모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재단의 개입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간섭은 없되 지원도 없는’ 현 상황에서 경영 안정성 확보나 지면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는 문제”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다만 독립언론의 ‘또하나의’ 사례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내부의 힘으로 편집권 독립을 확보했고 10년이 넘는 기간,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독립언론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김상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87년 6월 항쟁 당시, 연일 계속되는 시위 때마다 시민들이 부산일보 앞을 지나갔는데 항상 돌을 던지고 가 유리창이 깨지곤 했었다. ‘관제언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고 이같은 고민은 편집권 독립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모아졌다.”
편집국장 추천제를 쟁취해냈던 88년 언론사 최초의 파업 이후 13년, 부산일보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96년 12월 김영삼 정권이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부산일보는 27일자 3면 총파업 해설기사에 ‘김정권 퇴진 부산·경남이 앞장을’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97년 1월 8일자 1면엔 위천공단 건설과 관련 ‘정권퇴진 극한투쟁 경고’라는 제목을 뽑기도 했다. 신문지면에 ‘정권퇴진’이라는 제목을 찾아보기 힘들 때였다.
당시 부산일보 노조는 날치기 통과 당일 곧바로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 이 사실을 사회면에 게재했다.
올들어 되풀이되는 언론탄압, 개혁 논란을 둘러싼 부산일보 논조와 관련해서도 홈페이지에 ‘여당 대변지’니 ‘여기가 민주당 텃밭이냐’는 식의 비난이 올라오기도 한다. 지면에 대한 평가를 떠나, 적어도 신문제작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보도 흐름은 소유, 경영, 편집 분리라는 ‘3권 분리’ 체제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리고 그 근간은 경영, 편집에 대한 재단의 불간섭과 편집국장 3인 추천제로 대표되는 편집권 독립이다.
부산일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는 사장 선임 외에 경영이나 편집에 관여하지 않는다. 88년 파업 이후 당시 재단 이사장이 ‘외부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없다’고 언급한 것도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불문율’처럼 지켜지고 있다.
오진영 상무는 “정수장학회는 장학사업을 주로 하는 목적재단이기 때문에 사장 임명권 행사 외에 간섭은 없다. 사장은 전무, 상무 등 임원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편집국장 3인 추천제는 89년 첫 선거 이래 시행 13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수차례 관련 규정을 손보면서 입사 20년 이상, 편집국을 5년 이상 떠나지 않은 간부들을 대상으로 기자들이 투표를 통해 득표순으로 3인을 추천, 회사가 편집국장을 임명하는 골자가 유지되어 왔다. 통상 최다 득표자가편집국장으로 임명된다. 현 조영동 편집국장은 초대 노조위원장으로, 이 제도를 관철시킨 장본인이다.
편집국의 한 간부는 “파업 이후, 적어도 기자가 쓰고자 하는 기사를 못쓰거나 광고 때문에 기사가 빠지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또 “최근 언론개혁 논란에 대해서도 사설이나, 칼럼, 기사 방향이 다른 경우가 있을 정도로 내부 언로가 트여 있고 이것이 그대로 지면에 반영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조영동 편집국장(1·2대), 박창호 논설위원(3대), 박병곤 부국장(4대), 이헌율 정치부장(5대), 장지태 사회부장(8대), 이춘우 편집1부장(9대) 등 역대 노조위원장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것도 이같은 풍토의 일단을 반영한다.
재단의 불간섭과 편집권 독립이 무리 없이 유지되어올 수 있었던 데 대한 부산일보 내부의 분석은, 그것이 ‘파업을 통해 쟁취한 사안’이라는 점으로 모아진다. 이전의 경우 재단을 통한 정치권의 간섭, 그에 따른 경영진의 인사, 지면 개입 등이 있었지만 88년 7월, 6일간의 파업 끝에 편집권 독립을 쟁취해냈고 이를 기점으로 재단의 간섭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편집국의 한 부장은 “독립언론을 지향하는 경향이나 문화의 경우 그것이 IMF라는 외부변화에 의해 주어진 선택이었다면 부산일보는 ‘내부동력’을 통해 현재의 체제를 닦아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쟁취한 독립’의 힘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편집국에서는 이른바 메이저 신문들의 물량공세나 ‘언론사태’에서 드러나듯 지역 정서를 외면해서도, 거기에 야합해서도 안되는 입장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편집국의 한 간부는 “부산일보가 결코 이상적인 모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재단의 개입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간섭은 없되 지원도 없는’ 현 상황에서 경영 안정성 확보나 지면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는 문제”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다만 독립언론의 ‘또하나의’ 사례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내부의 힘으로 편집권 독립을 확보했고 10년이 넘는 기간,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독립언론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김상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