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지들이 최근 1년 새 잇따라 디지털에 ‘미술’ 관련 코너를 선보이며 ‘문화 대전’을 벌이고 있다. ‘문화’가 경제지 온라인에서 대표 콘텐츠로 거론되고 독자로부터 큰 반응까지 얻는 현상은 이례적이다. 문화예술 시장 저변 및 수요 확대, 독자 눈높이에 맞춤한 접근, 기자 개인관심사를 콘텐츠화하려는 흐름 등 맥락에서 시사점을 남긴다.
경제지 미술 콘텐츠 중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헤럴드경제는 지난해 4월부터 <이원율의 후암동 미술관> 연재를 이어오고 있다.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는 “미술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작품, 그래서 가장 혁신적인 작품, 결국에는 가장 유명해진 작품들을 함께 살펴”본다는 취지로 미술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전한다. 통상 200자 원고지 40매, 많을 땐 70매 분량이지만 연재마다 수십만 뷰가 나오고 수십~수백 건의 댓글이 달린다. 특히 ‘인물편’은 역사적 사실에 일부 상상력을 더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쓰이는데 프랑스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을 다룬 지난해 11월 ‘“로댕 아이를 뱄다” 폭탄선언 여성, 30년 수용소에 갇혔다’ 편은 60만~70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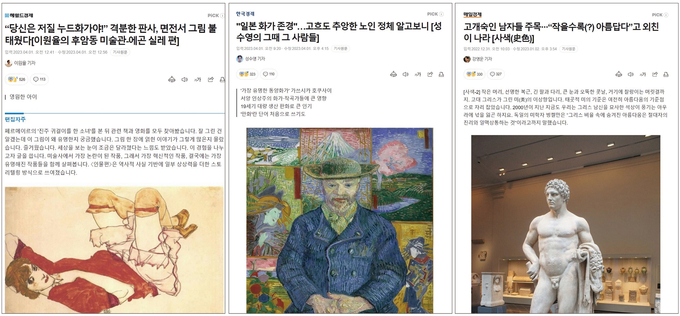
기획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2016년 입사해 사회부, 정치부 등을 거친 이원율 플랫폼대응팀 기자가 전담(4일 현재 네이버 구독 1만6189명)한다. 2013년부터 개인 ‘미술’ 블로그를 운영해 왔고 2021년엔 책 <하룻밤 미술관>을 출간한 경험이 있는 기자다. 그는 “10년 가까이 글을 써오며 성실하고 참신하게만 쓴다면 괜찮겠다 생각해왔지만 막상 첫 기사를 냈을 땐 무서워서 잠을 잘 못 잤다. 댓글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기사 하나로 구독자 역시 150~200명이 꾸준히 늘며 자신감을 얻었다”며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겠다’ 싶어 디지털부서에 자원했지만 시의성, 분량, 기사체를 생각지 않은 기획이 회사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했다. 큰 반응에 대해선 “제가 이해되지 않는 문장은 안 쓰거나 최대한 풀어쓰려 한다. 비전공자로서 틀에 매이지 않는 해석을 흥미로워 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천예선 헤럴드경제 플랫폼대응팀장은 “직장인을 위한 토요일 브런치용 양질의 문화 기사를 고민하다 나온 기획”이라며 “댓글 반응과 조회수, 독자들의 책 출판 요청 등으로 미술이나 문화예술 콘텐츠 수요를 재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타 플랫폼 유통을 위한 변형, 미술 아닌 분야로 확장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꼭 출입처가 아니더라도 기자들이 디지털공간에서 연재 등을 통해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입체적이고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지향하면서 기존 온라인팀의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독자들과 만나는 접점을 넓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헤경 ‘후암동 미술관’, 한경 ‘그때 그 사람들’, 매경 ‘사색’
지난해 6월 한국경제가 신규 코너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해 ‘참전(?)’하면서 토요일 온라인 영역에서 경제지들이 벌이는 ‘미술 대전’은 본격화됐다. 연재는 “미술과 고고학, 역사 등 과거 사람들이 남긴 흥미로운 것들에 대해 다루는 코너”를 표방하며, 사진설명을 포함하면 30~35매가 되는 분량으로 쓰인다. 후발 주자이지만 매체력을 앞세워 기사당 수십 만 뷰를 올릴 만큼 급성장했고, 영국 19세기 회화 거장 프레드릭 레이턴을 다룬 ‘“비혼주의라더니”…‘29세 연하女와 동거’에 쏟아진 비난’ 편은 100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다.
신방과를 졸업하고 2016년 입사 후 사회부, 경제부를 거쳐 지난 1년간 미술 출입을 담당했던 성수영 문화부 기자가 맡고 있다. 한경은 지난해부터 ‘고급문화’를 회사 주요 비즈니스 영역으로 삼는 기조를 이어왔다. 성 기자는 “어릴 때부터 미술관은 다녔지만 비전공자이고 현장 얘길 듣고 공부하면서 쓰고 있다. 미술사 전공자들은 소양이 높지만 대중과 접점은 부족한 만큼 강점이 있다고 본다”면서 “미술시장이 호황이었고 MZ세대까지 시장 저변이 확대된 시기 운좋게 맞물리며 예상치 못한 반응을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계열사 한경BP와 책 계약도 맺었는데 여러모로 동기부여가 된다”며 “기사와 달리 쌓인다는 느낌이 있고 콘텐츠 내용과 쓴 사람을 기억해준다는 의미도 남다르다”고 부연했다.
문화·예술 수요 확충… 대표 콘텐츠화, 독자 반응도 후끈
‘미술’ 코너는 아니지만 매일경제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매주 토요일 내놓는 코너 <사색(史色)>은 유사 맥락에 놓을 수 있는 사례다. 사회부 바이스를 맡고 있는 강영운 기자가 연재 중인 기획은 “역사 속 외설과 지식의 경계를 명랑히 넘나”든다는 설명대로 ‘색’의 관점에서 역사 이야기를 풀고 ‘미술작품’ 등을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다. ‘19세 미만은 보지 말라’는 문구가 포함되기도 하는 기사는 사드 후작을 다룬 지난 2월 ‘근친상간·가학성교로 가득한 ‘이 소설’...프랑스가 60억원에 사간 이유는?’으로 반향을 일으켰다.
2015년 입사한 강 기자가 ‘1인1연재’를 권장하는 회사 분위기에서 평소 관심 있던 ‘성의 역사’ 코너를 제안하며 시작됐다. 평일엔 사회 기사, 주말엔 소속 부서와 무관한 문화 기사에 바이라인을 올린다. 그는 “기자로서 자기검열도 하고 초반엔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냐’는 말도 들었지만 성은 금기시 할 게 아니고 재미난 연재가 열린 차원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읽은 책이 휘발되는 게 아쉬워 아이디어를 적어뒀었고 현재 48개를 써둔 상태”라고 했다. 이어 “미술 등 이미지 선정이 중요해서 품을 많이 들이고 있다”며 “기사와 달리 연재물은 기자 이름이 다가가는 것 같다. ‘사색’을 시작한 후 동료들과 외부 독자 반응에서 느낀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