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양레터 ‘인스피아’의 기획서를 받아들일 콘텐츠 공장은 많지 않다. ‘영감’을 뜻하는 영단어, ‘유명 학술콘텐츠 플랫폼’의 각 앞·뒤 세 글자를 따온 이름의 레터는 목적이 “영감을 주는 것”이다. 타깃은 “나의 세계를 넘어선 영감을 찾는 지식노마드”이고, 책을 다룬다. 타 매체가 경제, 재테크, 교육·육아정보로 어떻게든 구독자에게 쓸모를 어필하는데 이런 흐릿한 기획이라니. 그런데 이 레터, 의미심장하다. 담당자 김지원<사진> 경향신문 기자는 아예 “어떤 콘텐츠를 만들든 (중략) 비효율적인 자세만큼은” 지키겠다고 선언해 버리는데 구독자는 알음알음 늘고 있다. 출범 5개월, 별다른 홍보 없이 보낸 주간 레터(10일 기준 21편 공개)만으로 현재 1000여명이 본다.
그는 지난달 31일 인터뷰에서 “쓸모 없는 책을 읽고 쓸모 없는 데 집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관심 있을 주제에 대한 답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았다. 글을 잘 쓰지도, 똑똑하지도 않은데 유일한 무기는 시간이다. 대신 책을 읽고 안테나를 세워주면 몇 년 전까지 술만 먹던 저 같은 이들에게도 뭔가 전할 수 있으리라 봤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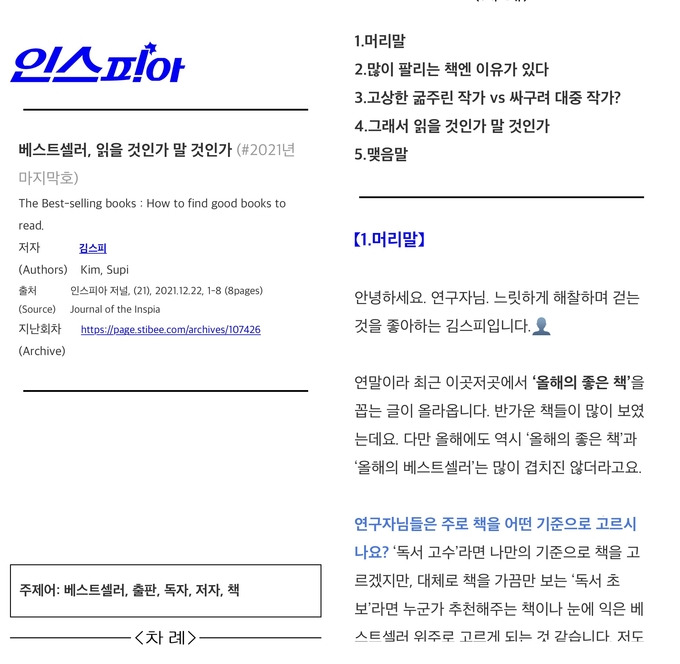
매주 수요일 오전 6시30분 배달되는 레터는 논문 형식의 서지정보와 목차로 시작한다. 편당 200자 원고지 약 50매 분량의 롱폼. “나온 시점보다 책의 메시지, 매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구간(舊刊)을 주로 다룬다. “안녕하세요. 연구자님. 느릿하게 해찰하며 걷는 것을 좋아하는 김스피입니다”라는 인사말에 담긴 단어 ‘해찰’(일에는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다른 짓을 함)이 성격을 규정한다. “쓸모가 있으면 해찰이 되지 않는다. 어떤 이슈의 찬반을 떠나 제 판단의 전제가 맞는지 더 딥(deep)한 걸 보고 싶은데 그런 글이 없었다. 원 소스를 보여주면 함께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봤다.” 그렇게 사고의 자취를 따라가면 “한 발 더 들어간 뾰족한”, 한 고유한 입장이 남는다. 글은 ‘서평’과 ‘큐레이션’, ‘독자에게 말걸기’의 중간 쯤이다.
인스피아의 강점은 친절함이다. ‘논문’ 외피 아래 ‘블로그식 글쓰기’가 놓인다. 쉬운 단어와 문장에 사진, 인터넷 밈(meme)을 한껏 사용하고, 유명 영화, 드라마를 언급한다. ‘벽돌책’을 모두가 이해하게 다시 쓴다. 특히 웃기는 데 진심이다. ‘짤방’을 효과적으로 쓰고, 거창한 인용구를 “마치 ‘주식으로 1억 만드는 법=2억으로 시작한다’류의 허무개그”로 정리해버린다. <일본을 반성한 역사가에 관한 고찰>편의 영어제목 처럼 고급 유머(?)도 종종 구사한다. “우직하게 스트(레이트)로 미는 기자들 역할은 중요하지만 안 읽는 기사도 의미 있다고 하고 싶진 않다. 옛날 기사를 보면 웃긴 게 정말 많다. 기자로 시작한 당대 소설가가 많듯 기사는 재미를 뺄 수 없는 대중서사인데 독자를 상상하지 않아도 되는 생태계 때문에 읽을 수 없는 글이 너무 오래 살아있다.”

최승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