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언 세계일보 기자가 지난 11일 별세했다. 향년 38세. 충청투데이와 대전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한 고인은 지난 7월 세계일보로 이직해 산업부에서 일해 왔다. 고인의 세계일보 입사 동기들이 쓴 추도사를 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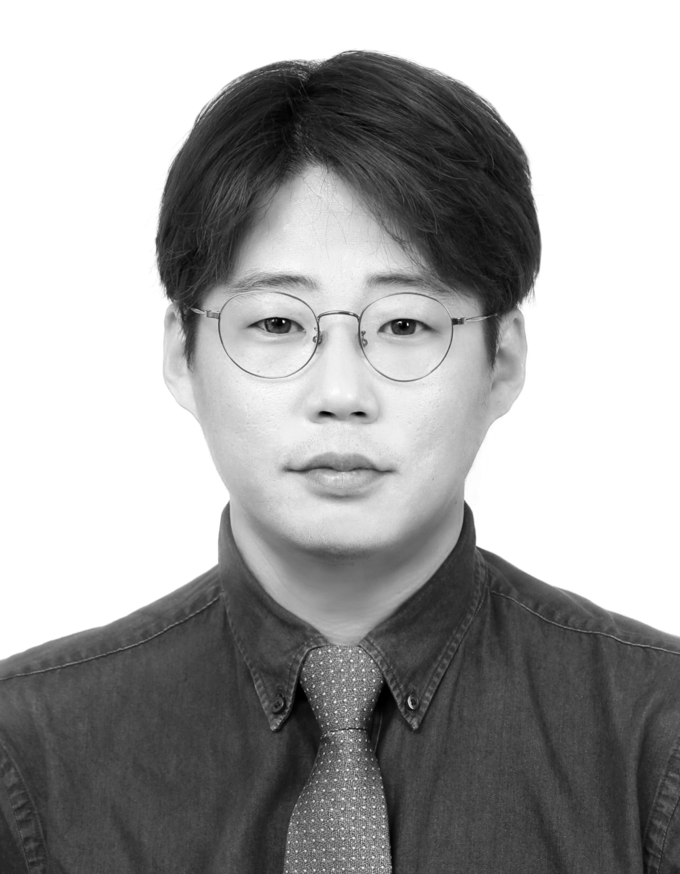
날벼락 같은 소식이 있고 난 뒤, 김용언 기자가 함께 있었던 단체 채팅방을 여러 번 쓸어 넘기며 훑어봤습니다. ‘7월 입사 동기들 힘냅시다, 다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글 남겼습니다’가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고맙습니다. 선배도 같이 힘냅시다’ 대답이라도 할 걸. 뒤늦은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메시지창 속 그의 모습은 평소와 같은데. 이제는 힘내자는 격려의 말은 듣지도, 건네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무언가 느꼈던 것일까요. 마지막 메시지는 사고 하루 전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급해서 그리 황망히 가셨을까요. 슬프고 안타까운 만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원망할 곳이 없다는 사실도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김용언 기자와는 2021년 7월 입사와 함께 처음 만났습니다. 4개월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처음 만난 7명의 동기는 처음엔 서로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년이 넘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았으니 어쩔 수 없었겠지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장 엄격할 때라, 모두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 수 없어 쉽게 친해지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고인은 그런 와중에도 나서서 친근함을 심으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식사 자리를 마련하려 노력하고, 회사에 들어와서 마주치는 날에는 먼저 반가워하며 곁에 다가와 “잘 지내요, 일은 좀 어때요”라고 물어왔습니다. “동기들 많은 게 복이죠”란 말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우리 글도 일일이 챙겨봤는지 “이번 기사 좋았다, 잘 봤다”라며 한마디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동기 중 가장 선배였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원체 정이 많고 주변을 잘 챙기려는 사람이라는 것이 짧은 인연에서도 항상 느껴졌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타향살이를 시작한 당신의 적응이 가장 힘들었을 텐데. 새삼 고마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김용언 기자는 세계일보로 이직하면서 혼자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사하려면 큰일 났다’는 푸념을 늘어놓으면서도,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눈빛만은 빛났습니다. 삶의 터전이 갑작스럽게 바뀌고, 생경한 출입처를 맡게 돼 걱정스러웠을 만도 하지만, 대화에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계일보에 대한 자부심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끼리도 ‘용언 선배 대단하다’는 말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함께 야근 중이던 동기의 메시지를 통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별일이야 있겠어’란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약한 소리를 전혀 한 적이 없는 그였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깨어나지 못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부검이 이뤄진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뒤 장례식장에서 그의 영정 사진까지 접했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선배, 대체 왜 가신 건가요.
짧은 인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때때로 김용언 기자 생각이 나겠지요. 함께 새 직장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만큼 더욱. 앞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의 ‘힘내자’란 말은 잊지 않으려 합니다. “선배, 편히 쉬세요. 저희도 힘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중에 다 모이면, 결국 못한 회식 같이해요. 고마웠어요.”
세계일보 입사 동기 일동
한국기자협회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