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의 ‘기’ 자만 꺼내도 인기를 얻기 힘들던 때가 있었다.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그만큼 뜨겁게 모이지 못했던. 하지만 몇 번의 폭염과 폭우, 대형 화재 등을 경험하고 팬데믹 시기를 보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도, 블랙핑크도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환경예능’을 콘셉트로 한 TV 프로그램들도 생겨났다. 이제 기후위기는 거대 담론과 ‘힙(hip)한’ 트렌드 사이의 무엇처럼 여겨지곤 한다. 지구온난화를 글로 배운 기성세대와 보고 경험하며 자란 청(소)년세대의 인식 차는 여전하지만 말이다.
바로 그 간극을 좁히고, 책임 있는 행동과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진심을 쏟는 기자들이 있다. 기후변화의 증거를 기록하고, 위험을 지속해서 경고하고, 당장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 진심인 기자들. 저마다 다른 경로로 기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모두의 문제이자 내 문제이기에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과 변화를 꾀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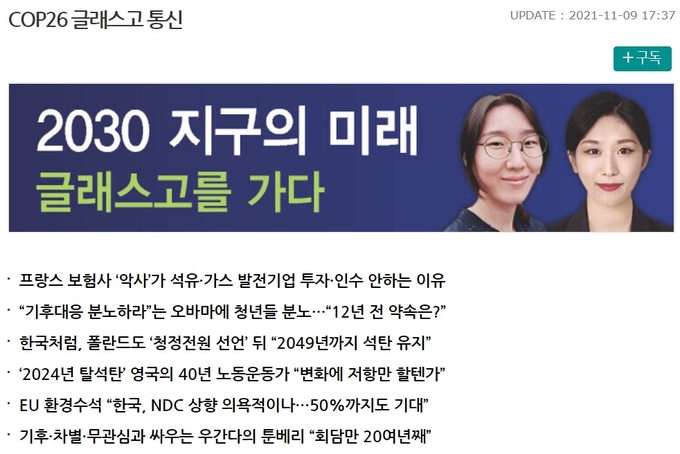
최우리 한겨레 기자는 지금 영국 글래스고에 있다.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취재를 위해 같은 기후변화팀의 김민제 기자와 함께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영국 땅을 밟았다. 문재인 대통령 등 세계 정상들이 참석한 회의인 만큼 국내에서도 청와대 출입 기자를 비롯해 유럽 특파원 등 많은 기자가 글래스고를 찾았고 환경부 출입 기자들도 갔지만, 총회 전담 취재를 위해 따로 기자들을 보낸 건 한겨레가 유일하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취재가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던 연초부터 이번 총회 취재를 계획했다는 최 기자는 “기후팀 기자로서 돈과 탄소 배출을 하면서 현장에 가는 것이 옳은가 고민을 했다”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취재하는 뉴스룸으로서, 현장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두 기자는 열흘 넘게 행사장 안팎을 누비며 탄소 감축 등에 관한 세계 정상 간의 협약, 국가 간 협상만이 아니라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사로,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윤지로 세계일보 기자도 연일 COP26 기사를 쓰고 있다. 환경부 출입인 후배 기자가 글래스고에 갔지만, 기획기사를 위해 아껴둔 채다. 총회가 끝나면 현지 취재 내용 등을 종합해 함께 기획기사를 낼 계획이다. 2019년 ‘뜨거운 지구 차가운 관심’을 연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의 기후 걱정은 국제부에 있는 지금도 여전하다. 시키지 않아도 기후 이슈를 찾아서 쓰고, 칼럼 주제도 대개 그쪽을 향한다. ‘2020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2019년 ‘EU 기후변화 기자상’ 등 수상 이력이 그의 활약상을 빛낸다.
이들이 기후문제에 천착하게 된 데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니다. 이메일 아이디에 환경을 뜻하는 영어 접두사 ‘eco(에코)’를 쓰는 최우리 기자조차 “기후변화팀에 왔기 때문”이라는 다소 싱거운 답변을 들려줬다. 물론 한겨레에 입사할 때 “좋은 환경 기사를 쓸 수 있는 언론사라는 믿음”이 있긴 했다. 윤지로 기자는 봄철 방해꾼인 미세먼지 문제를 취재하다 “결국엔 기후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케이스다.
2년 가까이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솔 경향신문 기자도 그 전엔 적당히 관심과 무관심을 오가는 “보통 사람”이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기후문제가 2년 전에 처음 나온 게 아닌데 나는 왜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지?’ “그 답은 너무 추상적인 문제로 생각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잘 읽힐 수 있는, 내가 독자라면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기사를 읽고 싶은지를 계속 고민하며 쓴 것 같아요.” 자신의 일터와 삶에서 기후변화를 직접 목격한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후변화의 증인들’ 기획은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 전체 기획에 영상을 더한 첫 시도 역시 사람들이 ‘내 문제’로 여기며 더 몰입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1년 전 신설된 한국일보 기후대응팀에서 첫 주제로 ‘제로 웨이스트’를 정하고 ‘실험실’을 콘셉트로 잡은 것도 “더 이해하기 쉽게, 자신의 문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덕분에 화장품 용기부터 참기름병, 아이돌 그룹의 앨범까지,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각종 폐기물에 둘러싸여 1년여를 보냈다. 아파트 분리배출장은 쓰레기이자 기사 아이템을 구하는 제2의 일터다. 신혜정 기자는 말했다. “취재를 위해 쓰레기를 만드는 건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기사를) 설계할 때마다 저희 자체로도 폐기물이 최대한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산업과 제도의 더딘 변화에 비해 팀원들에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일단 다들 분리배출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라벨 떼는 것도 그렇고,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으니까요. 물건을 살 때도 소재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버린 이후의 처리 과정이 다 보이니 고민하게 되죠.” 연재를 시작한 후, 신 기자는 새 옷을 사지 않게 됐다. 속옷과 양말류를 제외하곤 중고 의류를 사 입는다. 패스트패션이 대표적인 플라스틱 배출 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는 “중고의류가 품질도 좋고 선택지도 다양하다”며 “즐겁게 할 수 있는 실천”이라고 말했다.
아는 만큼 보이니 크고 작은 실천이 따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윤지로 기자는 전기를 덜 쓴다고 했다.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이 5~6만원대인데, 윤 기자네 집은 2만원 정도 나온다. “집에 종일 돌아가는 게 냉장고밖에 없어요.” 전기밥솥도, 공기청정기도 쓰지 않는다. 에어컨도 “진짜 여름에 죽을 거 같을 때 하루 이틀” 트는 게 전부다. “남편이 빨래 너는 게 귀찮으니 건조기를 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20%까지 올라가면 고려해볼게’ 했어요.(웃음)”
모두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똑같이 반응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이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닥친, 모두의 문제다. 김한솔 기자는 “기후위기는 어느 한 가지 분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거부터 직업까지 모든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며 “모두의 모든 분야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에게 윤지로 기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앞으로 기술과 산업이 다 그쪽으로 갈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걸 꼭 할 이유는 없었지만, 기술이 집중되고 경쟁이 벌어지면서 시장이 열렸잖아요. 기후변화로 인해 녹색 기술, 녹색 에너지 쪽으로 전환될 겁니다.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