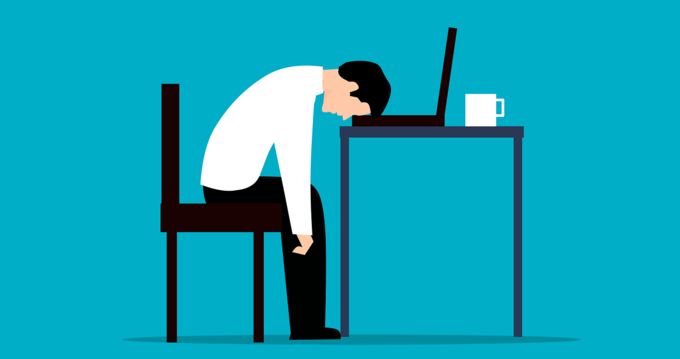
대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각 당에선 분주한 경선 일정이 진행 중이고,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등을 두고 후보 간 날선 공방도 한창이다. 무르익어가는 정치의 계절 한가운데, 정치부 기자들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본적인 대선주자 일정부터 국정을 뜨겁게 달구는 후보들의 말과 정책, 여러 이슈를 한시바삐 쫓고 챙겨야 해서다. 언제나 인력은 부족하고 써야 할 기사는 많게만 느껴지는 때,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전과는 달라진 대선 취재 환경은 정치부 기자들의 무력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대선 시기야 매번 바빴지만 특히 이번 대선은 여야를 합쳐 20명이 넘는 후보가 난립하며 기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창구 서울신문 정치부장은 “지난 대선이나 그 이전 대선을 보더라도 안철수, 반기문 후보 정도만 변수였다”며 “지금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될지 모르니 훨씬 품이 많이 들고 있다. 경선으로 후보가 추려지기 전엔 더 심했다”고 말했다. 부장원 YTN 기자도 “지금은 줄었지만 야당 대선 후보만 12명 정도 됐던 터라 팀원끼리 나눠서 일정을 챙겼다”며 “대장동이나 고발사주 의혹도 취재해야 하는데 타사에 비해 취재 인력이 많은 편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뭘 취재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선 일정도 주말에 몰리며 일주일 내내 일하는 정치부 기자들 역시 허다하다. 뉴스1에서 여당반장을 맡고 있는 이훈철 기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역 경선이 주말에 있다 보니 기자들이 돌아가며 토·일요일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땐 주중에 경선을 치렀는데 이번엔 다 주말에 몰려 있다. 경선 전에 인력을 충원해 국회팀만 19명인데, 기자 당 하루 10건에서 많게는 20건 사이 정도로 기사를 쓰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최근 고발사주와 대장동 등 굵직한 의혹들이 터지며 정치부 기자들의 업무 강도는 한층 더 세지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주로 국회를 담당해왔던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는 다만 “대선 시기가 되면 항상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며 “지난 대선 때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맞물려 있었고 그 이전 대선 땐 단일화나 야권연대 등이 화두였다. 2007년 대선 땐 BBK 의혹과 삼성 특검까지 있었으니 지금 상황이 특별히 더 고된 건 아니다”고 했다.
이전의 대선과 확연히 달라진 건 코로나19로 인한 취재 환경의 변화다. 이경태 기자는 “예를 들어 민주당이 지역 순회 경선을 한다고 하면 예전엔 경선 전후로 르포도 쓰고 현장 취재도 했을 텐데 지금은 많은 게 제한적”이라며 “경선만 하더라도 1사 1인 선착순이라 들어갈 수 있는 기자도 정해져 있고 후보들을 직접 대면해 취재할 수 있는 일정도 많이 없다”고 했다. 김수언 중부일보 기자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기자 간담회도 다 줌으로 열려, 이재명 후보 마크맨들이 모니터 앞에 이어폰을 꽂고 앉아 열심히 워딩만 치고 있다”며 “이 후보 측이 텔레그램으로 마크맨들에게 하루 10건 가까이 논평을 뿌리는데, 전부 다 쓰진 않아도 종합해 팔로우할 때마다 그저 받아쓰는 터라 무기력한 느낌도 든다”고 했다.
기자들은 이런 이유로 정치부 기자로서의 매력, 만족감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비단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점점 심화하는 포털 종속으로 속보와 ‘워딩’ 경쟁이 심해지며 정책 검증과 분석을 할 시간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창구 정치부장은 “사람들이 후보들의 말로만 투표하지 않을 텐데 후보들은 독한 말을 쏟아내야 기사 한 줄이라도 쓰이니 멘트 중심으로 싸우고 기자들도 워딩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며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가 실언을 했으면 그 실언을 공격하려는 워딩과 막으려는 워딩이 중심이 되고, 실언의 깊이를 분석하는 기사나 그 전후맥락을 취재해 보여주는 기사는 없는 식이다. 기사의 깊이가 낮다”고 평했다. 다만 이 부장은 “디지털로 많은 기사를 써내야 하니 그렇다”며 현장 기자들이 깊이 있는 기사를 쓰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역시 “지역지 상황을 감안하면 정치부 기자가 한 후보만 올인해 마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인력난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