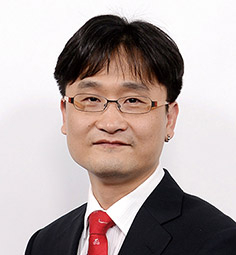
“구충제가 코로나19 치료제라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죽겠어요. 그게 진짜 효과가 있으면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하겠냐고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한인 의사의 하소연이다. 구충제 이버멕틴(Ivermectin)은 작년 말부터 이 땅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돌더니 일부 고위 관료와 정치인까지 가세했다. 그때마다 가짜뉴스 확인 사이트에서 ‘혹스(Hoax)’라고 판정했지만 이버멕틴 가격이 폭등하는 등 민심은 반대로 흘러갔다. 변변한 치료제를 구할 수 없는 이곳 현실이 반영된 안타까운 결과로 풀이된다.
그 와중에 지난달 15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이 이버멕틴 등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EUA)했다’는 기사가 현지에 떴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 일부가 받아 썼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21일 BPOM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EUA가 아닌 치료목적사용승인(Expanded Access Program·EAP)일 뿐 ‘여전히 이버멕틴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첫 보도가 오보로 밝혀지자 현지 매체는 정정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전 기사를 삭제했다.
정작 오보를 내보낸 한국 언론은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뒤이은 현지 매체의 정정 기사도 인용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연합뉴스가 애매모호한 해명성 기사를 썼을 뿐이다. 이번 오보 사태는 다른 문화 이해 부족이나 취재 제약 등으로 불거진 이전 오보들보다 상황이 심각하고 엄중하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먼저 잘못된 정보의 유통이다. 국내 일부 매체 오보에 원인을 제공한 연합뉴스의 최초 기사는 팩트도 틀렸고, EAP를 EUA의 하위 개념 정도로 설명한 내용도 부적절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EUA는 ‘임상시험을 마쳐서 치료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인 반면, EAP는 ‘임상시험 중이라 치료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의약품이다.
FDA는 “EAP 의약품은 치료에 효과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Use)’이라는 별칭답게 EAP는 다른 치료법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 마지막 수단으로 써야 한다. BPOM도 FDA와 맥락이 같은 세계보건기구(WHO)를 인용해 이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도 연합뉴스는 지난달 21일 현지 정정 보도를 소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닷새 뒤 관련 기사에 ‘이버멕틴이 EUA 의약품’이라는 오보를 다시 내보냈다. 다른 국내 매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작성한 지난달 30일 기사에는 ‘이버멕틴, 제한적 사용만’이라는 견강부회성 제목을 달았다. 연합뉴스를 인용한 매체들 역시 오보를 그대로 두고 있다.
둘째, 잘못되고 애매한 정보는 누군가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실제 오보 사태 즈음 코로나19에 감염된 한 교민은 초기에 이버멕틴을 처방 받고 버티다 폐렴으로 악화했다. 다른 교민은 연합뉴스의 오보를 보고 현지 병원에 찾아가 이버멕틴 처방을 요구하다 주치의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인들에게도 이버멕틴을 치료제로 소개하려 했다”고 털어놓았다.
셋째, 누군가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국내 매체의 오보는 다음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 상승 재료로 쓰였다. 실제 몇몇 관련 종목은 주가가 급등했다. 이후에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반면 해당 기사가 오보라고 밝힌 기사는 묻혔다. 오보를 믿고 투자했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가. 정확한 정보가 생명인 증시에 오보가 팩트인 양 소비됐다.
현지 기사를 번역했을 뿐이라고 해명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정정 기사를 아예 다루지 않았고, 이후에도 오보를 재생산했고, 후속 기사마저 사안을 정확히 다루지 않은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최근 FDA는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용 이버멕틴 복용은 근거가 없으니 중단하라”고 거듭 경고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고찬유 한국일보 자카르타특파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