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매일·부산 '네이버 100만' 입성은 했는데…
[지역사 네이버 구독자 증가의 명과 암]
전국에 지역여론·뉴스 전하는 역할
양적 결과 이어진 점 유의미하지만
수도권 뉴스, 어뷰징 등 남발 고민
네이버에 모바일제휴사로 입점한 지역신문 3사 모두가 약 1년6개월 만에 100만명이 넘는 네이버 구독자 수를 확보했다. 지역의 목소리를 전국에 전할 채널이 마련되고 양적인 결과로 이어진 점은 유의미하지만 지역뉴스만으론 구독자 확대나 뉴스 조회수 확보가 쉽지 않아 수도권 뉴스, 어뷰징성 기사가 남발되는 등 고민거리도 남는다.
지난 2019년 9월 네이버 모바일제휴사로 입점한 지역신문 3사는 23일 현재 모두 ‘구독자 100만’을 넘은 상태다. 부산일보는 지난해 8월 말, 매일신문은 지난해 12월 중순 ‘100만’을 넘겨 지난 12일 현재 각각 135만, 11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강원일보는 23일 현재 101만 구독자로 최근 이 대열에 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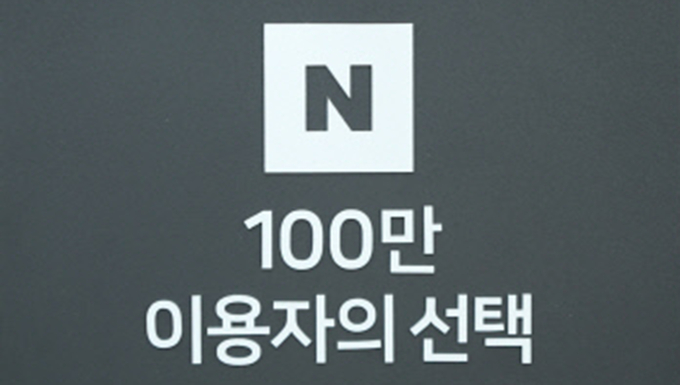
지역 뉴스를 전국에 전할 주요한 채널이 생겼다는 점은 그 자체로 성과다. 가덕도 신공항이나 오색케이블카 등 국책사업이나 정치적 사안에 차별화된 지역 목소리가 제시되고 여론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지역신문 3사 한 기자는 “종이신문, 고령층인 구독자의 한계 때문에 개별 기사에 대한 피드백이 드물었는데 모바일을 통한 전국 노출로 피드백의 속도나 양이 달라졌다. 지역민의 시각이나 입장을 대변한 기사가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점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수익이 전무한 디지털 부문에서 수익이 나오고 지역을 넘어선 매체 영향력을 체감하며 기자들이 고무되는 측면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양적 성장 이면에선 ‘서울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지역언론이 겪어온 어려움이 다시금 드러난다. 이들 신문사의 노력, 네이버의 플랫폼 파워, 수도권·비수도권 경계가 없는 코로나19는 구독자 확보의 동력이 됐지만 여의도 정치에서 의미가 남다르거나 수도권 거주자에게 관광·휴양지로 인식되지 못할 경우 진지한 논의 대상이 아예 되지 못하는 여건은 여전해서다. 이는 지역 3사가 네이버에 제공하는 기사들의 주제와 성격에서도 드러난다.

기자협회보가 지난 10일~15일 지역 3사가 직접 편집해 한 번에 6개씩 제공하는 네이버 모바일 ‘언론사 편집판’ 기사들을 10차례 조사한 결과 전체 180건(매체당 60건) 기사 중 117건(65%)은 해당 지역 이슈가 아니었다. 질병청의 전국 단위 코로나19 브리핑, 해당 지역 내외의 사회 기사(‘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세상에 이런 일이’류의 국제기사(‘중국산 절임배추 논란’), 연예인 또는 SNS 발 논란 등이 대표적이었다. 지역 목소리를 내세운 당초 취지와 달리 전국 뉴스, 어뷰징성 기사가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배성훈 매일신문 디지털 사업국장은 “입점 초기 어뷰징성 기사를 쓰지 않았는데 지역 기사만 올리니 페이지뷰가 전혀 오르지 않아 고민스러웠다. 지금도 지양하지만 아예 안 쓰면 페이지뷰가 전혀 나오지 않아 적당한 선에서 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문 주요지면의 기사들은 대부분 픽을 하고 디지털 논설위원직을 만들어 칼럼도 올리는 등 지역 현안은 거의 올리고 있다. 다만 많이 읽히지 않는데 계속 걸어둘 수 없어 올라가 있는 시간이 적다”고 부연했다. 부산일보 한 기자는 “지역뉴스가 포털에 없어도 되냐는 논리로 입점했는데 지역 정체성과 관련 있는 공들인 기사는 안 읽힌다. 특히 자극적인 황당 사건들이 먹히는데 지역을 범죄도시처럼 볼 편견을 조장할까 우려되고 안타깝다”고 했다.
지역 3사의 네이버 구독자 중 수도권 거주자는 40~45% 가량으로 전해진다. 지역언론으로서 정체성은 중요하지만 신규 독자가 다수 확보된 플랫폼에 맞춤 대응을 안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박진국 부산일보 멀티미디어부장은 “부산닷컴(홈페이지)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기사를 네이버에 걸어도 안 읽힌다. 지역을 내부 식민지처럼 보는 인식이 팽배한데 ‘지역색 있는 기사를 왜 안 드러내냐’는 건 사정을 모르는 것”이라며 “닷컴(홈페이지)과 네이버 독자 구성이 다르니 전략을 다르게 쓴다. 네이버엔 수도권 독자가 많은데 읽히는 기사를 써서 우리 채널에 들어오게 하고 진짜 우리 뉴스를 읽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보도자료발 인사기사나 대학소식 등도 지역에선 뉴스가치가 크다.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는 곳도 별로 없다. 안 쓸 수 없으니 재빨리 정리하고 다른 취재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데 ‘베꼈다’고 하면 힘들다. 더 낮은 잣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까지 업무영역이 확대되며 늘어난 기자들의 업무와 악화된 근로조건도 과제로 남는다. “하루에 마감이 몇 차례인지 모르겠다. 앉으면 써야한다”(부산일보), “수익은 미약하게 늘었고 할 일은 엄청 늘었다”(매일신문)는 말이 나온다. 강원일보에서도 코로나19 속보는 온라인에 먼저 쓰는 등 편집국 전반에 디지털 대응 분위기가 자리 잡으며 기자들의 업무가 늘었다. 간부를 포함해 총 5인에 불과한 디지털 부문의 부하는 특히 극심하다. 디지털 전용 콘텐츠가 나오거나 편집국, 디지털국 간 협업이 수월한 상황도 아니다. 더불어 네이버 노출 기사 품질이나 기존 페이지뷰 기반 디지털 성과 판단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가 이뤄지며 개선 시도가 나오는 것도 공통적인 분위기다.
강원일보 한 기자는 “회사에선 ‘100만’이란 성과를 강조하고 실제 의미도 있지만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다 정도이지 혁신이나 조직 차원에선 미약했고 과도기에 가까웠다”며 “기존 신문 기사를 평가하고 제안해 온 편집위원회를 미디어국까지 포함한 미디어편집위원회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논의 중이다. 어떤 기사가 필요하고, 또 노출되는 게 맞는지를 비롯해 여러 문제를 두고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