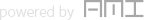|
||
| ▲ 한겨레 안수찬 기자 | ||
노동은 오래된 문제다. 그러나 언론에 등장하는 노동은 ‘화장한’ 얼굴이다. 통계청이나 노동부에서 내놓는 보도자료가 있다. 거기서 노동은 숫자로 화장을 한다. 아주 가끔 노사분규가 일어난다. 거기서 노동은 쟁의와 협상으로 화장을 한다. 기자는 숫자를 분석하거나 파업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노동에 대한 취재를 마친다. 기자도 독자도 노동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한다. 실업자가 늘고 임금은 줄고 비정규직만 양산된다는 것쯤 누군들 모르겠나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알고 있나?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임인택 기자는 반월공단 난로 공장에 취업했다. 그는 “침묵 노동”이라고 기사에 썼다. 일하는 자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임지선 기자는 서울의 갈빗집에 취업했다. 그는 “감정 노동”이라고 기사에 썼다. 일하는 자들은 사장, 손님, 남편을 위해 제 감정을 숨기고 꾸몄다. 전종휘 기자는 마석 가구 공장의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컨테이너에서 살았다. 그는 “닫힌 노동”이라고 기사에 썼다. 일하는 자들은 공장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안수찬 기자는 서울 대형마트에 취업했다. 그는 “히치하이킹 노동”이라고 기사에 썼다. 일하는 자들은 하찮은 직업을 갈아타며 평생을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니다. 강력한 구호도 아니다. 복잡한 정책은 더구나 아니다. 다만 기사로 옮기는 것조차 불편한 현실이다. 가난한 노동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들의 부모와 자식은 왜 가난한 노동자인가. 그들은 왜 아무 말 없이 감정과 의견도 숨기고 닫힌 세계를 인내하는가. 노동의 문제를 구조와 제도로 치환하지 않고, 정책적 대안을 공연히 병렬하지도 않고, 오직 그들의 감정과 경험과 일상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만 애를 썼다. 덕분에 지난해 7월 이후 우리 가운데 누구도 편하지 않았다.
임인택 기자는 말수가 줄었다. 임지선 기자는 밥 먹을 때 식당 아줌마를 재촉하지 않는다. 전종휘 기자는 엄지손가락에 못이 박히는 산재를 입고 수염이 덥수룩해져 돌아왔다. 안수찬 기자는 아직까지도 구운 고기를 먹지 않는다. 누군가 대안을 물었다. “노동자들이 편하게 공장에 출근할 수 있는 통근 버스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임인택 기자는 답했다. 고된 취재 끝에 우리는 작은 혜안을 얻었다.
다섯 달 동안 박용현 편집장 이하 ‘한겨레21’의 모든 기자들이 공장에 취업한 우리의 빈자리를 메웠다. 노동에 대한 탐사취재, 내러티브 기사작법, 5개월에 걸친 장기 연재, 1천매에 이르는 방대한 보도, 4차례에 걸친 표지 편집 등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노동 덕분이었다. 아직 부족함이 많은 기사를 칭찬해준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덕분에 올해 탐사보도 농사는 신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겨레 안수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