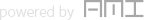매년 한글날을 맞아 여러 매체에서 ‘한글 예찬론’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착 언론사 내에선 외래어 사용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국적불명의 ‘외계어’와 ‘통신어’ 등이 범람하는 가운데 누구보다 공적매체인 언론이 한글 지키기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취재.편집부 = 취재부의 경우 외래어를 사용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관행처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경우 일반인들에겐 생소하거나 잘못 전달되는 등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일례로 사회부 경찰기자를 지칭하는 ‘사스마와리’(察廻)의 경우 일반인들은 경찰기자의 고달픈 업무와 연관해 가슴앓이를 한다는 의미에서 ‘사슴앓이’로 알고 있는 등 웃지못할 일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잘못 사용되는 외래어는 자칫 여러 병폐를 낳을 수 있지만 취재기자들 사이에선 아직 나와바리(출입처) 미다시(제목) 야마(핵심) 우라까이(뒤집기, 손질) 킬(kill) 등을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편집부의 경우 가로쓰기 후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 일본식 조판용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게(그림자) 게라(활자판 상자, 교정쇄) 기리누키(오리기, 오림) 다대(세로) 보카시(음영효과) 요코(가로) 등이 그 잔재로 남아 있다.
◇제작.윤전.발송부 = 제작.윤전.발송부의 경우 외래어 사용은 기계도입에 따른 교육과정에서 유래됐다. 또한 일부 용어는 일어와 영어 국어 등 혼재돼 이를 사용하는 실무자조차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들 부서에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외래어 사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으나 실무자들 사이에선 은연중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공통적인 반응이다.
제작부의 경우 편집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편집부와 중복된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 자체적으로 쓰이는 외래어엔 구구리(테두리) 기레빠시(자투리) 누끼(빼기, 삭제) 도트(망점) 돈보(기준점) 루페(확대경) 아미(음영처리)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윤전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에는 가미코스(종이가 이동되는 길) 기스(상처) 겐(겨누는 요점) 마끼도리칼(세정용 칼) 소부(판굽기) 요고래(더럽다) 등이 있다. 이 밖에 발송부에는 낫가리(정수) 아다마(머리) 찌라시(광고지) 하리(포장시 정렬되지 않은 신문) 등이 아직 쓰이고 있다.
◇문제점 = 언론사 내에서 외래어 사용은 가로쓰기와 CTS(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도입 후 자체적으로 많이 자정됐다는 게 실무자들의 평가다.
하지만 각 부서 실무자들은 급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외래어를 내뱉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외래어 남발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신문 박상훈 윤전부장은 “예전에 비해 일본어 사용이 70~80%정도 줄었지만 급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자주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바른 우리말 지키기는 공적매체인 신문사는 물론 그 소속원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지적도 이다.
어문교열기자협회 임승수 회장은 “최근 언론사 내에 쓰이던 외래어가 일어에서 영어로 바뀌고 있다”며 “일부 편리함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도 여과 없이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자들의 공적책무를 고려한다면 우리말 순화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특히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국적불명의 ‘외계어’와 ‘통신어’ 등이 범람하는 가운데 누구보다 공적매체인 언론이 한글 지키기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취재.편집부 = 취재부의 경우 외래어를 사용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관행처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경우 일반인들에겐 생소하거나 잘못 전달되는 등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일례로 사회부 경찰기자를 지칭하는 ‘사스마와리’(察廻)의 경우 일반인들은 경찰기자의 고달픈 업무와 연관해 가슴앓이를 한다는 의미에서 ‘사슴앓이’로 알고 있는 등 웃지못할 일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잘못 사용되는 외래어는 자칫 여러 병폐를 낳을 수 있지만 취재기자들 사이에선 아직 나와바리(출입처) 미다시(제목) 야마(핵심) 우라까이(뒤집기, 손질) 킬(kill) 등을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편집부의 경우 가로쓰기 후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 일본식 조판용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게(그림자) 게라(활자판 상자, 교정쇄) 기리누키(오리기, 오림) 다대(세로) 보카시(음영효과) 요코(가로) 등이 그 잔재로 남아 있다.
◇제작.윤전.발송부 = 제작.윤전.발송부의 경우 외래어 사용은 기계도입에 따른 교육과정에서 유래됐다. 또한 일부 용어는 일어와 영어 국어 등 혼재돼 이를 사용하는 실무자조차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들 부서에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외래어 사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으나 실무자들 사이에선 은연중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공통적인 반응이다.
제작부의 경우 편집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편집부와 중복된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 자체적으로 쓰이는 외래어엔 구구리(테두리) 기레빠시(자투리) 누끼(빼기, 삭제) 도트(망점) 돈보(기준점) 루페(확대경) 아미(음영처리)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윤전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에는 가미코스(종이가 이동되는 길) 기스(상처) 겐(겨누는 요점) 마끼도리칼(세정용 칼) 소부(판굽기) 요고래(더럽다) 등이 있다. 이 밖에 발송부에는 낫가리(정수) 아다마(머리) 찌라시(광고지) 하리(포장시 정렬되지 않은 신문) 등이 아직 쓰이고 있다.
◇문제점 = 언론사 내에서 외래어 사용은 가로쓰기와 CTS(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도입 후 자체적으로 많이 자정됐다는 게 실무자들의 평가다.
하지만 각 부서 실무자들은 급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외래어를 내뱉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외래어 남발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신문 박상훈 윤전부장은 “예전에 비해 일본어 사용이 70~80%정도 줄었지만 급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자주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바른 우리말 지키기는 공적매체인 신문사는 물론 그 소속원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지적도 이다.
어문교열기자협회 임승수 회장은 “최근 언론사 내에 쓰이던 외래어가 일어에서 영어로 바뀌고 있다”며 “일부 편리함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도 여과 없이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자들의 공적책무를 고려한다면 우리말 순화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