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통 언론은 기로에 서 있다. 젊은 세대의 절반가량이 소셜미디어를 주요 뉴스 소스로 삼고, 기성 언론사가 아닌 개인 크리에이터로부터 신뢰와 진정성을 찾는다. 이 변화 앞에서 언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미탈리 무케르지 소장과 노스웨스턴대 제레미 길버트 교수는 크리에이터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자들은 언론사 이름이 아닌 개인을 따른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길버트 교수는 더 나아가 언론사를 ‘크리에이터와 지원 서비스의 결합’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뉴욕타임스가 기자를 영상 크리에이터로 육성하고, 르몽드가 크리에이터를 고용하는 것이 그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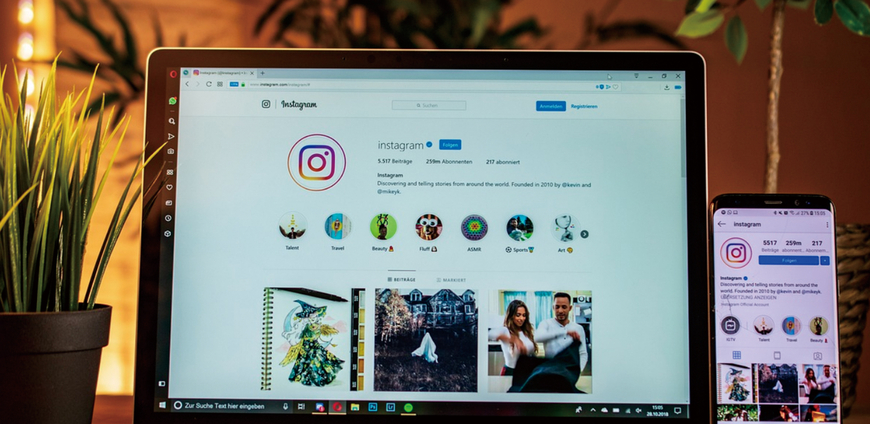
반면 조지아대 제시카 매독스 교수와 더피벗펀드의 트레이시 파월 대표는 크리에이터 수용에 비판적이다. 트레이시 파월은 ‘언론계의 인플루언서 집착은 추후 값비싼 후회를 낳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30세 미만 성인의 37%가 인플루언서에게 뉴스를 얻지만, 그중 77%는 저널리즘 훈련을 받지 않았다. 인플루언서의 인센티브 구조는 책임성이 아니라 관심 끌기다. 조회수와 ‘좋아요’에 의존하면 필연적으로 선정주의로 흐른다.
우리는 지난 20년간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통해 플랫폼 의존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체감했다. 포털에 기댔을 때 우리는 알고리즘에 종속됐고, 소셜미디어에 올인했을 때 플랫폼의 정책 변화에 휘둘렸다. 크리에이터에 대한 의존도 마찬가지다. 크리에이터 개인의 이동과 선택에 우리 운명을 맡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크리에이터와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인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협력은 ‘종속’이 아닌 ‘선택적 파트너십’이어야 한다. 언론사가 크리에이터를 영입하거나 협업할 때, 편집권과 저널리즘 기준은 타협할 수 없다. 조회수를 위해 선정성을 용인하거나, 팩트체크를 건너뛰거나, 윤리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협력의 전제는 언론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며, 그 원칙 안에서 크리에이터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더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먼저, 크리에이터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데이터와 전문성 기반의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 인플루언서는 빠르고 친근하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지만, 수년간의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석하거나, 복잡한 정책의 함의를 해부하거나, 1차 자료에 접근해 검증하는 일은 할 수 없다.
데이터 저널리즘, 장기 추적 보도, 전문 분야별 심층 취재팀 운영이 그 방법이다. 기후변화의 지역별 영향을 시계열 데이터로 분석하거나, 복잡한 경제정책의 이면을 전문가 인터뷰와 함께 파헤치는 것. 이런 콘텐츠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독자가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지식 자산’이 된다. 인플루언서의 2분짜리 쇼츠 영상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

다음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인플루언서와 언론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점이다. 크리에이터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날 수 있지만, 언론은 그럴 수 없다. 취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즉각 정정하며,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시하고, 팩트체크 프로세스를 독자가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투명성과 책임성이 쌓여 신뢰가 된다. 그리고 그 신뢰야말로 장기적으로 독자가 구독료를 내고, 후원하고, 우리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이유가 된다.
인플루언서는 친밀감을 판다. 우리는 신뢰를 판다. 친밀감은 변덕스럽고 휘발성이 강하지만, 신뢰는 오래 지속된다. 다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매일매일 정확한 보도, 투명한 과정, 책임 있는 자세로 증명해야 한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