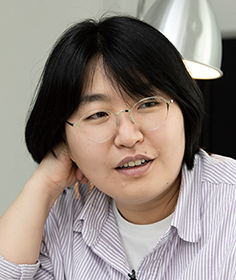
요즘은 정보공개센터가 아닌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비상행동’ 상황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상황실에서 내가 맡은 일은 집회와 행진의 기획이다. 집회에서 누가 어떤 연대의 발언을 할지, 시민들과 함께 힘을 낼 노래와 공연은 무엇일지 상황실 동료들과 함께 논의해서 정한다. 광장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대단할 수가 없다. 지금 시민들은 다들 저 아름답고 용감한 문장들을 가슴속에 품고 살고 있는 걸까. 끝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인파 앞에서도, 한밤중이라고도 새벽녘이라고도 부르기 민망한 야심한 시간의 도로 한복판에서도, 시민들은 떨리는 몸에 힘을 주어 저마다의 결의와 웃음을 담아 동료 시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건넨다. 예술가들은 또 어떤가. 장갑을 끼고 있어도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추위에 차가운 마이크를 쥐고 기타 쇠줄을 맨손으로 튕기는 모습을 보면 저들의 손과 목소리는 어떤 뜨끈함으로 채워진 걸까 사뭇 궁금해질 정도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방울방울 모아 100일 넘게 광장을 이어왔다. 어림잡아 헤아려보니 12월3일 불법계엄 이후 지금까지 한 집회만 해도 60회가 넘는다. 발언을 한 시민, 정치인, 활동가는 600명이 넘고, 음악과 춤으로 함께한 이들은 1000명이 넘는다. 광장을 메운 시민들도 700만 명은 훌쩍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함께하는 집회와 행진을 위해 개인적으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안전한 광장을 만드는 일이다. 최근 들어서는 극우 유튜버들이 행진을 하는 시민들 사이에 난입해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고, 평화로운 행진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시민들이 부상을 입거나 체포를 당하기도 하는 상황이라 물리적인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집회와 행진 곳곳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인권침해감시 법률인들과 의료안전을 담당하는 의료인들이 함께하고 있다. 형광조끼를 입은 시민자원봉사단도 곳곳에서 집회를 빈틈없이 채운다.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심정적 안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각자의 상태나 처지와 관계없이 나다운 모습을 지켜가며 한목소리로 광장을 메울 수 있도록, 집회의 발언이나 공연에서 혐오와 배제가 없도록 강조하는 이유다.
그래서 매 집회는 “모든 참여자는 발언 시 반말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성·성소수자·장애인·청소년·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와 비인간동물을 차별하거나 대상화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모두의 약속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매번 느낀다. 문장으로는 쉬운 이 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혐오·차별·배제의 언어를 일상화해 왔었는지를 말이다. 처음에는 ‘새끼’나 ‘년’ 등으로 끝나는 원색적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잘 거르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화하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었다. 이건 비단 발언에서뿐만이 아니다. 수십 년 전의 민중가요 노랫말에는 ‘형제’만 언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해학인 양 여성이나 장애를 대상화하는 가사가 섞여 있기도 하다. 하지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런 노랫말을 들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예술인이 해당 가사를 기꺼이 개사해서 모두를 위한 노래로 바꿔 불러주었기 때문이다.
발언에서는 간혹 튀어나오기도 한다. 언젠가 무대에 오른 어떤 이가 지금의 세태를 이야기하며 ‘거지같다’고 했다. 한 정치인은 발언 중 윤석열을 비판하며 ‘5살 아이에게 총을 쥐여준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집회를 기획하는 나도 무심코 넘겼던 말들이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나오자 광장의 시민들은 이 언어를 바로바로 꼬집어 주었다. ‘거지같다’는 말은 빈곤을 부정적으로 대상화하는 말이라는 지적이 바로 왔다. 하긴, 우리는 좋은 상황을 ‘거지같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 누군가는 ‘5살 어린이는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라는 SNS 글을 게시하며 어린이를 미숙한 존재로 표현하지 말라고 해당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사실 우리는 안다. 잘못은 잘못 그 자체로 말해도 된다는 것을. 굳이 장애, 질병, 나이, 동물, 국적, 인종에 빗댈 이유가 없다. 혐오와 차별과 배제를 담은 말은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품고 있던 속 시원한 말이 아니다. 누군가를 광장에서 위축시키고, 조롱거리로 삼으며, 함께 웃지 못하게 하는 말일 뿐이다.
광장의 시민들 모두의 노력을 담아 혐오와 배제, 차별을 가르고 광장을 채우고 있다. 이 광장은 4개월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노동자의 광장, 장애인의 광장, 가난한 이들의 광장, 여성의 광장, 어린이의 광장, 기후정의의 광장, 전쟁 반대의 광장, 차별금지의 광장들…. 무수한 광장들 덕분에 지금의 광장이 채워졌다. 이렇게 채워진 태도들은 물줄기가 되어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나 나다울 수 있는, 혐오와 배제, 차별을 가르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광장에 남아 있고 싶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