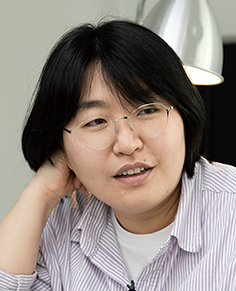
정보공개청구만 17년째 하고 있다.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전문가라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일까, 간혹 기자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어떡하죠?”라는 질문을 받는다. 내가 받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야말로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을 끔뻑거리게 된다. 자료가 없어서 못 준다는 건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건지, 비공개라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다시 질문과 대답을 오가며 맥락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내가 기자에게 묻는다. “시간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정보공개청구는 오랫동안 활용되어온 취재기법 중 하나다. 현장 취재뿐 아니라 탐사보도, 데이터저널리즘, 팩트체크 영역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쓴 기사에는 [단독] 말머리도 자주 붙는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직접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자료로 쓰는 것이니 단독이 맞긴 하다. 그래서일까, 언론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기자가 된 후 수습기자 기본교육에도, 경력기자의 심화교육에도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심심치 않게 배치된다. 이 정도면 기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수시로 하고, 정보공개청구로 만든 기사도 일상적으로 나올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자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해본 적 있냐, 몇 번이나 해봤냐’ 질문을 해보면 ‘들어는 봤지만 해본 적은 없다, 한두 번 해 봤는데 원하는 자료를 못 받아 그 이후에는 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공공기관에 들어온 정보공개청구는 184만여건, 공개율은 94.3%에 달한다. 정보공개율은 90%가 넘는다는데 내가 만난 기자들의 대다수는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한다. 정보공개청구가 직업인 나라고 기자들과 다르지 않다. 나 역시 청구한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모 기관에서 “비공개임을 공개함”이라는 답변서를 받은 기억도 있다. 그래서 정부의 공개율 94.3%라는 통계가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청구인이 기자라서, 활동가라서 자료를 안 주는 건가요?’라고 묻기도 한다. 하지만 경험상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경향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왜 원하는 정보를 받아본 기자들은 적을까.
어찌 보면 기자들이 자료를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 공개하길 꺼리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기꺼이 공개하고 싶어 하는 자료는 일부러 정보공개청구할 필요도 없다. 알아서 보도자료로 나온다. 기자들은 예산집행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숨기고 싶어 하는 사안들을 파고들어 정보를 요구한다. 감추고 있는 걸 청구하는데, 순순히 공개할 리 만무하다.
하지만 영원한 비공개는 없다. 지금 당장은 비공개를 하지만, 그건 눈앞의 공개를 면피하기 위한 경우도 적지 않다.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의신청만 해도 공개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 내가 기자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이유다. 당장 기사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 긴 호흡을 가져도 되는 거라면 공개 가능성은 더 커진다. 3년여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헌정 이후 한반도 공개된 적 없던 검찰 특수활동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음 공개됐고, 특활비 유용에 대한 보도 이후 올해는 검찰 특활비가 전액 삭감되는 변화도 생겼다.
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내일 보도하기 위한 용도로 정보공개청구는 알맞지 않다. 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는 10일의 시간이 걸린다. 비공개를 받을 거라 미리 마음먹는다면 이의신청까지 넉넉하게 한 달을 잡는 것이 마음 편하기도 하다. 비공개됐을 때는 그 사유도 살펴보고 이를 추가 취재할 수도 있다. 비공개가 아닌 정보부존재, 즉 자료가 없다고 답한다면 불법적 은폐나 행정의 사각지대인 사안은 아닌지 확인해볼 일이다. 정보공개청구는 쓸만한 취재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영원한 비공개란 없으니까.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