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영진이 2일 “해외연수에 육아휴직자를 차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일보 노조와 기자 107명이 성명을 통해 요구한 책임자 사과와 연수 추천 배제 결정 철회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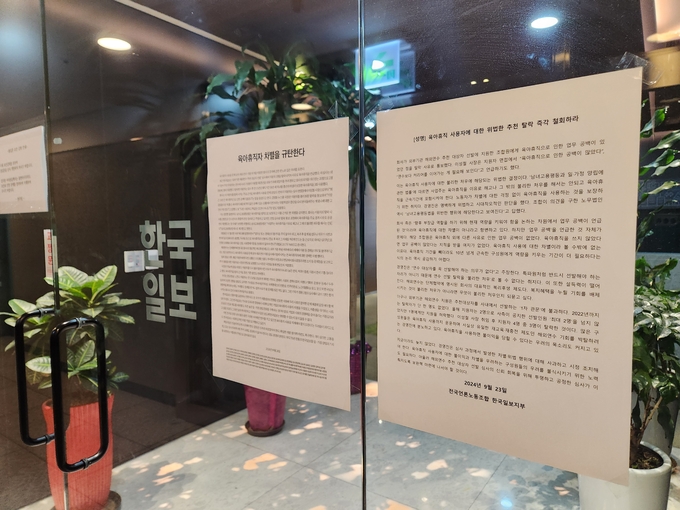
사측의 입장문 내용을 두고 구성원 내부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구성원이 요구했던 육아휴직자 차별 발언에 대한 사과나, 해외연수 선발 탈락 조치에 대한 결정 철회 등의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해외연수 선발에서 탈락 조치된 해당 기자와 노조는 노동청 진정서 제출 등 이번 사안이 차별인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일보는 2일 사내게시판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육아 휴직자를 차별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이번에 논란이 된 육아휴직은 해당 기자를 선발하지 않은 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과거 커리어와 연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은 1년 연수를 떠나기보다는 현업을 이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회사는 판단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측은 해당 기자에게 ‘업무공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인정했다. 한국일보는 입장문에서 “당사자에게 심사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향후 부장급 역할을 하기 위해 현재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논하는 차원에서 업무공백이 언급된 적이 있으나, 그 맥락과 배경, 즉 전체 커리어와 연수 후 인사 등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횟수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사용 여부는 전혀 고려 요인이 아니며, 재직기간 성과와 연수계획, 커리어 관리, 연차 등 인사적 고려만이 평가의 요소였다. 육아휴직 다녀오면 혹시나 해외 연수를 못갈 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사측의 입장문엔 해당 기자에게 사실상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입장문 서두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는 지원자 개인에 대한 인사 상 판단과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시비를 가르는 내용을 일일이 다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해외연수자 선발 때도, 개별 사정은 다르지만 뉴스룸국을 상당 기간 떠나 있었던 고연차 지원자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해외연수보다는 업무 연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선발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한 기자는 사측 입장문에 대해 “‘탈락 사유가 따로 있다, 말하기 어려운 다른 결격 사유가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프레이밍 하는 것인데 굉장히 문제적인 2차 가해”라며 “입장문 내 주장이 전체적으로 모순돼 있다. 육아휴직은 의사결정의 변수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뉴스룸국을 떠나있던 다른 기자가 탈락한 전례도 언급해 형평성을 맞췄다고 했는데, 결국 육아휴직 기간을 뉴스룸에 떠나있던 기간으로 봤다는 내심이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선발 당락 유무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본질은 이성철 사장과 김영화 뉴스룸국장의 차별 발언”이라며 “해당 기자가 선발됐다고 한들, 의사결정권자들이 너는 육아휴직을 많이 했어라는 식의 발언을 공공연히 했다는 건 명백한 차별이다. 그런 발언에 대해선 반성의 작은 기미조차 없어 여전히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국일보 기자는 사측의 입장에 “뻔뻔하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기자는 “입장문 말미에 베트남 탐방, 단기특파원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써놓았는데 이런 ‘달래기 방침’이 너무나 속보여서 보기 좋지 않다”고 했다.
앞서 8월29일 한국일보가 진행한 ‘외부기관 해외연수 추천 대상자 선발’ 심사에서 이성철 사장은 해당 기자에게 “최근 10년간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이 많았다”며 관련 질문을 했다. 또 김영화 뉴스룸국장은 해당 기자에게 선발 탈락을 통보하며 “가장 걸림돌이 된 게 출산, 육아휴직 때문”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박지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