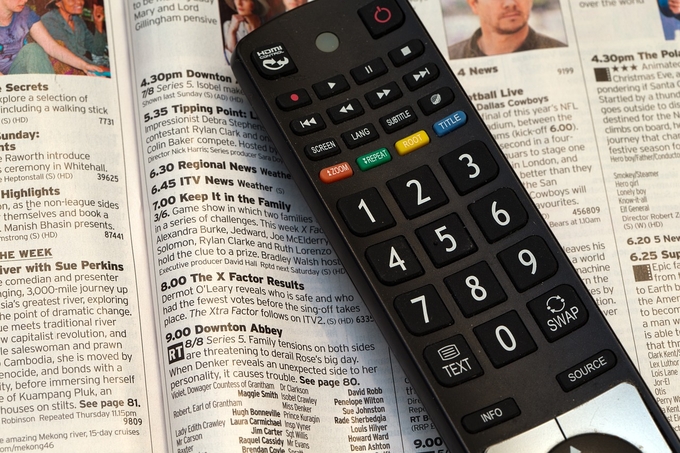
‘노혜령의 Media Big Read’는 디지털 플랫폼 전환기에 나타나는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변화를 톺아보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코너입니다. 격월로 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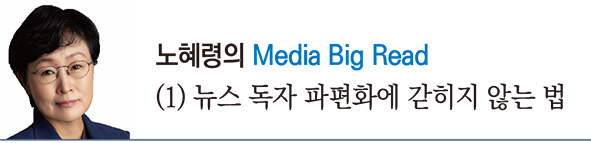
신뢰받는 언론이 사랑받는 건 상식이다. 신뢰도는 뉴스 구독 및 시청률의 전제 조건이다. 그런데 이 공식이 깨지고 있다. 편파적일수록 구독과 시청이 증가하는 사례도 흔하다. 한국 언론만의 현상도 아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다. 왜 그럴까.
고-선택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 독자는 파편화된다는 가설이 있다. 고-선택 미디어 환경이란 케이블TV, 인터넷 매체, OTT 등 뉴미디어 증가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선택지가 많아진 환경을 말한다. 지상파 3사와 과점적 언론사들만 있던 ‘저-선택’ 미디어 환경에서는 평균적으로 뉴스 소비도 엇비슷했다. 9시가 되면 TV 수상기 앞에 앉았고 아침이 되면 신문을 펴들었다.
프린스턴 대학교 마커스 프라이어 교수는 공중파 방송만 존재하던 저-선택 방송 환경에서는 대부분 사람이 뉴스를 시청하고 정치를 학습하지만 케이블 방송의 등장으로 시청할 프로그램이 증가하자 정치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격차가 벌어짐을 실증했다. 케이블 TV와 인터넷의 도래가 뉴스 선호층과 비 선호층 사이에 정치·사회 이슈의 지식 격차를 벌려 놓는다는 것이다.

뉴스 헤비 유저들은 다양해진 뉴스 덕에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논쟁적 이슈를 파고들어 관점을 세운다. 이들의 언론 ‘신뢰’ 기준도 달라진다. 뉴스 저소비층은 ‘인상 비평’ 수준에서 언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높은 신뢰도 점수가 주로 이들에서 나온다면, 구독 및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언론 수용자 조사 데이터에는 케이블 방송을 중심으로 이런 독자와 신뢰도의 파편화가 엿보인다(그림 참조). 2019년 TV조선을 가장 신뢰하는 언론으로 꼽은 응답자 중 보수층은 42%였지만 2021년에는 61%로 크게 뛰었다. 반면 진보 비중은 11%에서 13%로 증가하는 데 그쳐 양 진영의 비중 격차가 47%포인트에 달했다. 보수 독자들의 편애가 강해지는 동안 TV조선의 뉴스 시청률은 오히려 크게 올랐다. 간판 뉴스인 뉴스9 시청률은 4~6%를 오르내리며 MBC 뉴스데스크와 2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
미국의 상황은 더 심하다(그림 참조). 옥스퍼드대학교 로이터 인스티튜트의 조사에 따르면 CNN 뉴스를 신뢰하는 진보와 보수층 격차는 2022년 조사에서 58%포인트에 달했다. 편향 보도의 대명사로 꼽히는 폭스 뉴스(39%포인트)보다도 격차가 크다. CNN은 지난 몇 년간 진보 쪽으로 급선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호황을 누렸다. 그 대가로 신뢰의 아이콘에서 가장 극화된 미국 뉴스 브랜드로 전환된 것이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새 CEO 크리스 리히트는 CNN을 중도 포지션으로 되돌려 놓겠다며 대대적 개편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8일 미국 중간 선거 방송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MSNBC에 시청률을 역전당하는 굴욕을 당했다. 이날 CNN의 시청자 수는 260만명에 그쳐 320만명을 기록한 MSNBC에 크게 뒤졌다. 폭스 뉴스(740만명)와 비교하면 1/3 수준이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런 딜레마를 보도하면서 “CNN은 분열된 미국에서 중립을 원한다. 누가 시청할까?”라는 제목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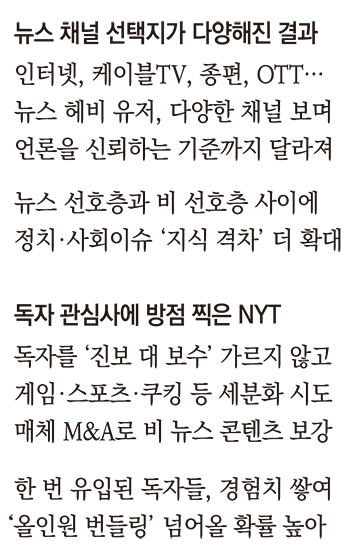
더 큰 문제는 방송 뉴스 시청 습관도 빠르게 스트리밍 채널로 이동 중이라는 점이다. 폭스 뉴스는 2018년 뉴스 쇼와 다큐멘터리, 리얼리티 쇼 전문 스트리밍 채널인 폭스 네이션(Fox Nation)을 출범시켰다. 폭스 뉴스의 간판 앵커 터커 칼슨의 ‘진한 맛 버전’ 뉴스 쇼를 폭스 네이션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편성하는 등 더 강력한 보수 팬덤 기반의 유료 구독 모델을 추가했다. 구독 모델은 고-선택 미디어 환경에 기름을 부어 뉴스 독자 파편화에 불을 지른다. 팬덤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충성 팬들의 입맛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케이블 TV(폭스 뉴스) 시청자들에게는 순한 맛, 지불 의향이 높은 헤비 유저들에게 스트리밍(폭스 네이션)을 통해 진한 맛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시청자 세분화 전략을 구사한다. 이에 반해 CNN은 지난해 3월 스트리밍 채널 CNN+를 론칭했다가 3주 만에 문을 닫았다. 초기 구독자 부진과 경영진의 비용 절감 압박이 빚어낸 참사였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뉴스 독자 파편화는 정해진 미래다. 20세기식 중도나 균형의 저널리즘만으로 극복될 수 없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디지털의 고-선택 미디어 환경과 구독 모델이 빚어내는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뉴스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진다.
이 지점에서 뉴욕타임스의 M&A 전략을 리뷰하면 새로운 포인트가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뉴스 헤비 유저들만을 대상으로 진보 대 보수로 가르는 대신, 오디언스 세분화의 기준을 ‘관심사’로 틀었다. 고-선택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 선호가 약화된 독자들을 뉴스로 끌어들이는 풀(pull) 전략을 쓴 것이다. 비뉴스 콘텐츠 보강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적극 활용했다. 2016년 인수한 와이어커터는 상품 리뷰 사이트다. 기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엄격하게 테스트하고 그 후기를 올린다. 선택이 어려운 독자들의 고민을 도와주는 것이다. 리뷰 기사를 읽다가 마음에 들어 상품명을 클릭하면 e-커머스 사이트로 이동하고, 구매가 이뤄지면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디지털형’ 수익 모델이기도 하다. 연 40달러로 와이어커터만 구독할 수도 있다.
게임 상품의 구독도 증가세다. 뉴욕타임스는 1942년부터 단어 퍼즐 게임을 실었다. 뉴스 구독을 유인하는 마케팅 수단이었다. 이런 전통은 디지털 버전의 단어 퍼즐 게임인 워들 인수로 이어졌다. 연 40달러를 내고 게임만 구독할 수도 있다. 접근하기 쉽고, 중독성 높은 워들은 해외 독자들까지 뉴욕타임스 플랫폼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게임을 즐기는 구독자들도 많아 뉴욕타임스 플랫폼 광고 효과도 높여준다. 단어 퍼즐 게임 애호가들은 지적 호기심이 높아 뉴스 구독으로 쉽게 유인된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경험이다.
지난해 초 인수한 디지털 네이티브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The Athletic)은 뉴욕타임스에 다목적 외연 확장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 스포츠뿐 아니라 아마추어 동호회까지 속속들이 커버하는 지역지 성격을 겸하고 있어 뉴욕타임스가 전국 구석구석까지 침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뉴스 비선호층인 MZ 세대 유인도 겨냥하고 있다. 디애슬레틱 유료 구독자 100만명 중 뉴욕타임스 구독자는 1만2000명뿐이어서 중복도 거의 없다.
이외에 쿠킹 레시피, 듣는 뉴스 오듬 등 활자 뉴스 이외의 상품들을 통해 플랫폼의 외연을 넓히고 새로운 뉴스 독자 획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런 비-뉴스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상품을 구독하면서 유입된 유저들은 뉴욕타임스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에 물들고 점차 중독돼 올인원 번들링으로 넘어오는 확률이 높다.
뉴욕타임스식 전략은 독자 파편화에 갇히지 않고 디지털형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 추구를 전제로 한다. 오랜 시간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승자 독식의 뉴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하에서만 가능하다. 누구나 모방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 성공한 2~3개 기업만 살아남는 치킨 게임의 성격이 짙다. 실패하면 잃는 것도 크다.
플랫폼 투자가 어려운 기업은 콘텐츠 전략에 집중하는 편이 현명하다. 그러자면 어느 독자층을 타게팅할지, 어떤 콘텐츠를 핵심 역량으로 키울지 전략을 잘 짜야 한다. 독자 세분화 역량이 중요하다.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부의 분류 틀에서 벗어나 디지털 변화로 생기는 의외의 시장 공백(unmet needs)을 찾아내는 눈도 필요하다. 뉴욕타임스에 인수된 디애슬레틱의 전략도 연구해 볼 성공 사례다. 지역 언론이 힘들어지면서 실종돼 버린 지역 스포츠 저널리즘의 빈자리를 잘 포착해 단기간에 디지털형 모델을 구축한 인사이트는 참고할 만하다.
팩트 중심으로 이데올로기적 중립과 균형을 지키는 20세기식 저널리즘 윤리는 여전히 중요한 원칙이지만, 디지털 시대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저-선택 미디어 환경에서 만들어진 뉴스 산업의 틀과 법칙을 모두 의심해 보는 것이 디지털 미디어 지형을 효과적으로 읽어내는 빅 리드(Big Read)의 출발점이다.
노혜령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초빙교수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