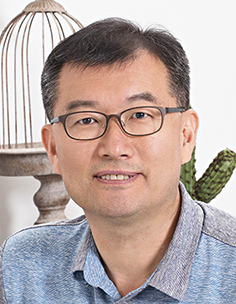
▲김재섭 한겨레 선임기자
이동통신 3사에 물었다.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단독 기사의 취재가 시작된 지점이다. 이후 무려 3개월에 걸쳐 이통사들에게 ‘기지국 접속기록을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 축적했느냐?’고 묻고 또 물었다. 이통사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만 반복했다. 어쩔 수 없이 이통사들이 기지국 접속기록을 축적해온 사실, 이통사들의 “확인 불가” 답변은 사실상 사전 고지와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대목을 우선 기사화했다.
이통사들이 5600만명에 이르는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기지국 접속기록을 몰래 축적해온 사실의 무게 때문이었을까.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이 취재를 도왔고, 이통사 내부 임직원들의 제보도 잇따랐다. 드디어 취재 물꼬가 터졌고, 이통사들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기지국 접속기록을 몰래 축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통사들은 기지국 접속기록을 몰래 축적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을 주고 있잖냐?”는 주장을 편다. 적반하장 격이다. 자식과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조차 행사되지 않는 상태로 넘겨줄 수 없다는 생각에 고집스럽게 취재를 이어왔다. 팍팍 밀어준 한겨레 최우성 산업부장과 김경락 산업팀장에게 감사드린다. 이통사 관계자들의 전화에 시달리는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던 아내와 딸에게도.
김재섭 한겨레 선임기자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