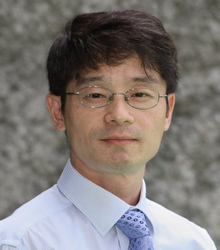
▲권태호 한겨레신문 출판국장.
<뉴닉>의 김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지금 <뉴닉>에선 되는 일이, 그때 기존 언론사에선 안 됐는지’ 알 것 같았다. <뉴닉>은 철저히 ‘고객 중심’이다. ‘독자’가 아닌. 비즈니스·서비스 마인드로 똘똘 뭉쳐 있었다. 뉴스 선정 때부터, 자신들의 그때그때 ‘감’이 아닌, 미리 만들어 놓은 체크리스트를 펼쳐놓고 따졌다. ‘고객 니즈(필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뉴닉>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고객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타깃 독자층도 25~35살 사회초년생으로 좁혔다. 이어 끊임없이 물었다. 설문조사, 오픈 채팅방, 독자들과의 오프라인 모임, 그리고 이메일마다 ‘뉴닉에게 알려주기’ 배너를 부착해 상시 피드백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하루 평균 20~30건, 많을 때는 200~300건의 독자 의견을 받는다. “(뉴스레터 문체를) 반말이 나은지, 존댓말이 나은지, 이모티콘은 몇 개나 넣는 게 적당한지 등도 묻는다” 했다.
기존 언론사의 공급자 마인드는 알아도 못 고치는 고질이다. 독자와의 소통 확대, 가볍고 상시적인 접촉, 무엇보다 독자 최우선주의 등 기존 언론사들이 신생 미디어 스타트업인 <뉴닉>에 배울 점이 적지 않다. 하지만, ‘기존 미디어 조직이 이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또 온전히 합당하기만 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배어 나왔다. 한 걸음 떨어져 기사를 재가공하는 <뉴닉>과 딱 붙어서 사회현상과 동시호흡 해야 하는 언론사의 행동양식이 온전히 같을 순 없기 때문이다. 혜화동 <뉴닉> 사무실을 나올 때, 지난 일들이 절로 반성됐지만, 여전히 눈앞이 훤해지진 않았다.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 본사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허탈함과는 또 달랐다. 지난해 7월 미국 뉴욕 맨해튼 본사에서 고든 페어클러프 국제에디터로부터 <월스트리트 저널> 회사 소개를 들으면서 “국제부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다. 그는 즉각 답하지 못했다. “음…, (책임자인)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특파원 포함해 대략 300명쯤 된다”고 말했다. 멍했다. “그럼 편집국 기자들은?”,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아 100명 가량 내보내, 지금 1000명쯤”이라 했다. 그 다음부턴 그의 말이 귓전에 머물지 않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비결’을 참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디지털 유료화 성공 비결’을 간략하게 설명했으나, 그들에겐 간략한 일이, 우리에겐 복잡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그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 앞에선 핑계라도 댈 수 있었지, <뉴닉> 앞에선 또 무슨 변명을 해야 하나.
권태호 한겨레신문 출판국장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