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컬(Vertical)미디어 전략이 최근 언론계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버티컬미디어 전략은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한 전문분야 매체를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과거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 아닌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용자를 껴안아 트래픽은 물론 비즈니스 모델까지 발굴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새로운 미디어 강자인 복스미디어가 대표적인 매체로 리코드(기술전문매체), 더버지(IT), SB네이션(스포츠전문), 폴리곤(비디오 게임), 복스(정치해설 전문), 이터(푸드), 랙크드(패션) 등 8개 언론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실제 조선비즈는 지난해 미디어잇을 인수한 뒤 지난달 말 ‘IT조선’으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기존 산업부에도 IT팀이 있지만 매출 증대 등을 위해선 전문화된 매체로 키우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투데이 역시 지난 2일 편집국 내에 문화부가 따로 있지만 10여명 기자를 신규 채용해 ‘비즈엔터’를 창간했다. 과거 인물 중심의 연예기사에서 벗어나 엔터테인먼트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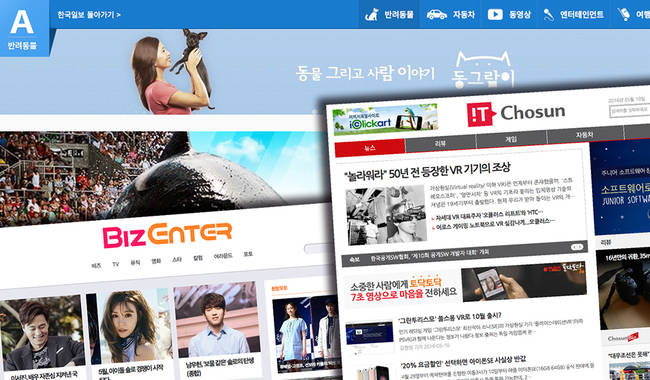
▲최근 언론계에선 법인설립까지 염두에 둔 버티컬미디어가 잇달아 창간되고 있다.
기존에도 자사 홈페이지에 서브매체를 둔 경우는 있었지만 최근엔 별도의 법인 설립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5~6년 전만 해도 위험부담이 큰 전략으로 받아졌는데, 주력 매체와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자기잠식효과가 더 컸기 때문이다. 광고주인 기업 입장에선 같은 회사로 인식해 주어진 예산에서 홍보·광고비를 나눠 집행하다보니 매출증대 효과는 적고 인건비와 제작비 부담은 커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엔 온라인 매체 창간을 통해 이런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버티컬미디어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 소비가 ‘풀’(언론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뉴스를 찾는 행위)에서 ‘푸쉬’(새로운 기사가 소셜 미디어나 모바일 알림으로 독자를 찾아가는 방식)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언론사들이 버티컬미디어 전략을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특히 기존 뉴스룸이나 부서에서 노력해도 기존 매출규모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반면 버티컬 미디어가 성공할 경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조선일보가 버티컬미디어로 설립한 조선비즈는 지난해 매출 202억원, 영업이익 58억원을 기록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따라할 수 없는 게 버티컬미디어 전략이다. 매체특성상 전문성이나 차별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3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출범 등으로 포털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트래픽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으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언론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그럼에도 버티컬미디어 전략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종이신문에서 빠져나간 매출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비미디어사업이나 미디어사업 중 택일해야 하는데, 투자여력 등을 감안했을 때 비미디어사업보다 미디어사업에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투데이 전중연 미디어기획실장(상무)은 “새로운 독자들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현 조직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 규모는 뻔하다”며 “버티컬미디어 전략을 통해 개별 매체를 성장시켜 전체 조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