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차례 낙방 끝 언론사 입사…마감 압박 거셌지만 1년간 행복
비전 부재에 밀려드는 회의감 “단독조차 세상 바꿀 수 없더라”
사회 부당함 지적하고 싶었는데 수습 교육 자체가 부당·비합리
기사 잘 쓰는 선배는 있었지만 좋은 삶을 사는 기자는 없었다
# A씨는 15살 때부터 기자가 되고 싶었다. 사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 믿었고, 윤리적 잣대가 직업의 훌륭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언론정보학과에 진학해 공부를 하고 저널리즘스쿨에서 실무를 배우면서, 학생 기자와 언론 유관단체 인턴 등으로 경력을 쌓으면서 A씨의 꿈은 점점 확고해졌다. 2012년 2월 대학을 졸업한 그는 본격적으로 언론사에 원서를 넣기 시작했다. 2년 간 30여 차례 떨어졌지만 의지는 더욱 불타올랐고, 2014년 2월 그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 신문사에 입사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바라던 기자의 꿈을 이룬지라 A씨는 1년 동안 진심으로 행복했다. 마감의 압박은 거세고, 취재도 기사 작성도 쉽지 않았지만 재미있기만 했다. 그땐 뭐든지 신기하고 즐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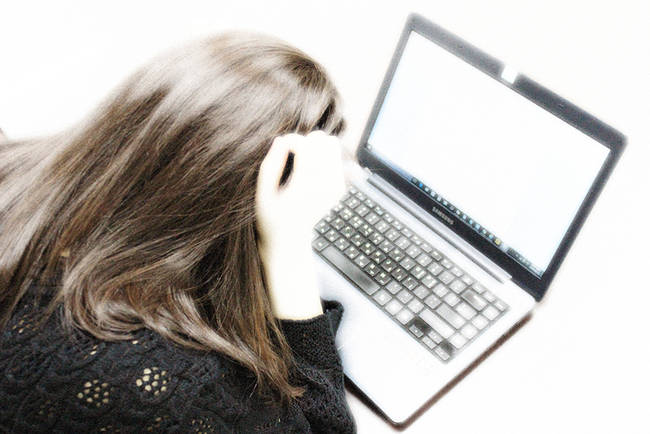
▲기자의 꿈을 이룬 젊은 기자들이 절망을 안고 언론계를 떠나고 있다. 젊은 기자들의 이탈은 미래 핵심자원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언론계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씨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뇌를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씩 떠내는 듯’ 고통스럽게 쓰는 기사는 민주주의나 시민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단독조차도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해 갔다. 결국 그는 입사한 지 1년6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A씨는 “언젠가 그만둘 바에야 일찍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며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 B씨는 부모님 말씀대로 명문대에 갔지만 전공에 흥미가 없었다. 선배들처럼 대기업에 들어가 부속품처럼 살기 싫었다. 할 말 하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논술을 쓰면서 B씨는 불현듯 ‘기자’라는 직업이 떠올랐다. 기자라면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수차례 떨어지기를 반복하다 1년여 만에 신문사에 합격했다. 이른바 메이저라 불리는 곳이었다. 날아갈듯 기뻤다. 가족과 지인들 모두 그를 축하해줬다. 수습기자 생활이 고달프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잘 버틸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수습 생활이 시작되니 일이 많다거나 잠을 못자는 건 별 게 아니었다. 사회의 비합리와 부당함을 지적하고 싶어 기자를 꿈꿨는데 수습 교육은 비합리와 부당함 그 자체였다.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월급에 빚만 늘어갔고, 체계적인 교육은 없었다. 본래 일에 수습까지 떠맡은 선배들은 서슴없이 폭언을 내뱉었다. “이걸 당연하다는 듯 여기는 언론계 문화가 몰상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입을 하나의 규율과 생각으로 무자비하게 다루는 언론사에서 성장한 기자들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얼마나 담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무엇보다 B씨가 보기에 기사를 잘 쓰는 선배는 있었지만 좋은 삶을 사는 기자는 없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숙취에 시달리다 발제하고 기사 쓰고 다시 술 마시는 삶. B씨는 그런 삶을 살기 싫었다. 결국 그는 수습기간 3개월 만에 회사를 떠났다. “더 버티다가는 현실에 안주할 것 같아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꿈꾸던 일이었지만 이제 절대 기자는 하지 않을 거예요.”
수습기자들과 1~5년차 주니어 기자들의 이탈은 언론계의 고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다. 불합리한 의사결정구조, 구태적인 조직문화, 강도 높은 스트레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곳곳에 존재하는 난관에 젊은 기자들은 쉽게 좌절한다.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욕망,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목표가 쉽게 무너지는 것 또한 그들에게는 독이다. 그래서 아예 언론계를 떠나는 젊은 기자들의 모습은 이제는 쉬이 볼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돼 버렸다. 주니어 기자들의 이탈 현상과 관련해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송상근 이화여대 프런티어저널리즘스쿨 교수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고참 기자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는 종종 봤지만 언젠가부터 5년차 미만, 수습기자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젊은 기자들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뉴스룸의 건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간과하기 힘들다. 201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의 직업 환경과 역할 정체성’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기자의 이탈은 해당 언론사가 보유할 미래 핵심자원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의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킨 후 현장에 투입했지만 그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