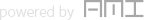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기로 언론개혁의 목소가 높아가고 있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소유와 경영, 경영과 편집권의 분리로 결국 ‘편집권의 독립’을 말한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한·독 기자교류를 위한 사전 답사의 일환으로 독일을 방문한 길에 편집권 독립이 오랜 전통으로 정착된 독일 유력 언론사들을 찾아 편집장들로부터 편집권 독립의 역사, 소유와 경영, 경영과 편집권과의 관계를 들었다.
독일은 신문에 있어 편집권 독립이 철저히 보장돼 있는 나라다. 사적 기업으로써 이윤 추구보다는 언론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독일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과거 독일 언론의 뼈아픈 경험 때문이다. 즉 언론이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나찌즘에 ‘부역’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 언론은 누구의 소유라는 개념보다는 언론의 공공성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다. 과거 1960년대 정부가 언론관련법을 제정해 신문을 통제하려할 때 전체 언론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율적 통제기구인 ‘언론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독일은 소유와 경영, 경영과 편집이 자연스럽게 분리됐다.
이에 대해 ‘타게스 슈피겔지’ 편집장 아펜젤러 씨는 “신문사도 하나의 기업으로 보면 한 축으로는 경제적 이윤추구가 목표지만 또 다른 축은 사회적 공적기관로서의 역할”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편집과 경영이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일의 경우도 한국처럼 사주가 기자들의 인사권까지 갖고 있던 때도 있었으나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의 일, 즉 60년이나 된 오래전 이야기”라며 “지금 독일의 발행인은 편집장 보다 힘도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독일 신문의 편집장은 편집방향 결정, 기자들의 인사권, 지면의 증·감면 등 신문 발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다. 또 편집장은 형식적으로 발행인이 임명하지만 편집국 내부와 선임자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요한 지멘스 편집장은 “룬트샤우의 경우 파짓(Fazit)이라는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재단에서 편집장을 임명하지만 편집국의 의견과 선임자에 의해 선출”되며 “편집장은 편집방향과 기자 인사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광고와 판매 등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 말했다.
광고주로부터도 독립돼 있다. ‘베를리나 짜이퉁’의 마틴 슈스킨스 편집장은 “광고문제로 사주나 광고주와 마찰을 빚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실례로 60년대 ‘디짜이트’라는 신문에서 모 다국적 기업을 비판하는 글을 쓰자 그 기업이 앞으로 광고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때 디짜이트의 사장이 직접 편지를 보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당신 회사의 광고를 우리 신문에는 절대 싣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사건을 독일 언론인들은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언론개혁의 핵심은 소유와 경영, 경영과 편집권의 분리로 결국 ‘편집권의 독립’을 말한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한·독 기자교류를 위한 사전 답사의 일환으로 독일을 방문한 길에 편집권 독립이 오랜 전통으로 정착된 독일 유력 언론사들을 찾아 편집장들로부터 편집권 독립의 역사, 소유와 경영, 경영과 편집권과의 관계를 들었다.
독일은 신문에 있어 편집권 독립이 철저히 보장돼 있는 나라다. 사적 기업으로써 이윤 추구보다는 언론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독일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과거 독일 언론의 뼈아픈 경험 때문이다. 즉 언론이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나찌즘에 ‘부역’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 언론은 누구의 소유라는 개념보다는 언론의 공공성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다. 과거 1960년대 정부가 언론관련법을 제정해 신문을 통제하려할 때 전체 언론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율적 통제기구인 ‘언론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독일은 소유와 경영, 경영과 편집이 자연스럽게 분리됐다.
이에 대해 ‘타게스 슈피겔지’ 편집장 아펜젤러 씨는 “신문사도 하나의 기업으로 보면 한 축으로는 경제적 이윤추구가 목표지만 또 다른 축은 사회적 공적기관로서의 역할”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편집과 경영이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일의 경우도 한국처럼 사주가 기자들의 인사권까지 갖고 있던 때도 있었으나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의 일, 즉 60년이나 된 오래전 이야기”라며 “지금 독일의 발행인은 편집장 보다 힘도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독일 신문의 편집장은 편집방향 결정, 기자들의 인사권, 지면의 증·감면 등 신문 발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다. 또 편집장은 형식적으로 발행인이 임명하지만 편집국 내부와 선임자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요한 지멘스 편집장은 “룬트샤우의 경우 파짓(Fazit)이라는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재단에서 편집장을 임명하지만 편집국의 의견과 선임자에 의해 선출”되며 “편집장은 편집방향과 기자 인사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광고와 판매 등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 말했다.
광고주로부터도 독립돼 있다. ‘베를리나 짜이퉁’의 마틴 슈스킨스 편집장은 “광고문제로 사주나 광고주와 마찰을 빚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실례로 60년대 ‘디짜이트’라는 신문에서 모 다국적 기업을 비판하는 글을 쓰자 그 기업이 앞으로 광고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때 디짜이트의 사장이 직접 편지를 보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당신 회사의 광고를 우리 신문에는 절대 싣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사건을 독일 언론인들은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