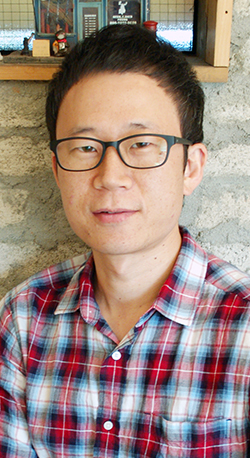 |
||
| ▲ 한겨레 고나무 기자 | ||
지난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연희동 자택을 포함해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의 추징금 확정 판결 이후 16년만이다. 전 전 대통령을 꾸준히 추적해온 한겨레 고나무 기자는 “기쁜 한편 허탈했다”고 말했다. 2분이라는 짧은 한순간을 위해 16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돌아왔는지에 대한 상념이었다.
지난 6월 ‘아직 살아있는 자 전두환’을 출간한 고나무 기자는 전두환의 육사 동기, 그의 전기를 썼던 작가 등 전두환과 그를 기억하는 이들을 통해 “잔혹하면서 인간적이고, 소탈하지만 권위주의적이며, 영악하면서 반지성적인” 전두환이라는 ‘문제적 인간’을 그려냈다. 전두환과 핵심 관련자 등 12명이 인터뷰를 거절하며 “살아있지만 죽은 자를 쓰는 듯”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각종 회고록과 미 국무부 문서 등 다양한 기록으로 ‘사실 확인’에 충실했다.
그는 지난해 한겨레21에서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씨의 땅 의혹을 파헤친 ‘도둑님들’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고, 올해 5월부터 한겨레가 크라우드소싱으로 기획한 ‘전두환 재산 찾기’ 팀장을 맡아 은닉 재산과 조력자 등 전두환 관련 보도에 몰두해왔다.
고 기자가 처음부터 전두환에 집중한 것은 아니었다. 2010년 정치부에서 일할 당시 박정희 재평가 논쟁을 보며 보수주의를 더 알아야겠다는 막연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박정희 관련 회고록 등 2년 여간 관련 서적을 손에 닿는 대로 읽었다. 처음 관심은 전두환보다 김종필이었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전두환 사열 논란, 일부 종편의 5·18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 보도는 전두환이 살아 있는 과제이자 풀어야 할 숙제임을 재확인시켰다.
그동안 ‘악인’이라는 틀에 가려졌던 질문도 스스로 던졌다. ‘과연 전두환은 왜 집권을 했는가.’ 책은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고 기자는 지난해 대선 결과를 보며, 1979년 겨울을 떠올렸다. 유신 독재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국내외 모든 이들은 민주주의의 이행을 당연히 예상했다. 하지만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나타난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두환이었다.
“전두환은 악마가 아니다. 쿠데타를 막지 못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이끌지 못한 선한 세력의 부작위다.” 그는 선한 세력이 무능할 때 한 사회는 그에 어울리지 않는 리더를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한겨레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전두환 추징금 문제를 제기해 여론을 환기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5월20일 보도가 나간 4일 후 검찰이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발표하며 환수작업에 전격 나섰기 때문이다. “그간 추징 미납 문제의 최고 책임자는 직무를 유기한 검찰”이었다는 고 기자는 “채동욱 검찰총장 지휘 아래 비교적 공정하고 책임있게 수사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자진납부 재산 목록에는 한겨레21이 단독보도한 전효선씨의 안양시 관양동 땅과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한 이순자씨 30억원의 연금 예금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한겨레 ‘전두환팀’이 지난달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추징금 환수 의사는 밝혔지만 끝은 아니다. “재산 은닉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해요. 또 재산 은닉의 조력자인 부실한 금융실명제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죠.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에 전두환·노태우의 비리 처벌 등이 누락된 점 등 역사 왜곡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기자생활 10년차인 고나무 기자는 ‘전두환’으로 시작한 문제적 인간 및 범죄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 “탐사기획보도와 동시에 신문 저널리즘의 한계를 넘어 논픽션과 르포르타주로 풀어내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